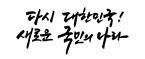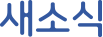보도/설명
- 제목
- 천년 전 ‘조새’ 지금도 사용하다.[곽유석]
- 등록일
- 2007-08-01
- 주관부서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706
조새는 굴을 따는 어로도구이다. 굴은 우리나라 연해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예부터 우리 민족의 먹을거리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해온 패류이다. 선사시대 유적인 조개더미(패총)에서 굴 껍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즐겨먹었을 식품으로 추정된다. 조선 성종 12년(1481)에 펴낸『동국여지승람』에는 굴이 강원도를 제외한 7도, 70여 고을의 토산품으로 기록되어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굴은 흔히 석화(石花)라 부르는데, 이는 바위에 붙어있는 굴 껍질이 하얀 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유래되었다고 한다. 굴은 단백질 등 영양분이 풍부하여 ‘바다의 우유’라는 별칭이 붙었고, 국·전·죽 등 다양한 음식에 쓰이며 젓갈을 담거나, 생으로 먹기도 한다. 특히 겨울철에 나는 ‘매생이’(해조류)국에는 꼭 굴을 넣어야 제 맛이 난다. 필자가 아는 한 숙취해소에 이 매생이국 보다 좋은 것은 없는 것 같다.

[조새의 구조]
굴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바위에 붙어 있는 굴 껍질을 벗기고 알을 채취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조새인데 형태는 매우 간단하다. 생김새를 보면 그림 1에서 보듯이 손잡이, 몸통, 쇠날, 그리고 종질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전체 길이는 25~30㎝ 정도이고, 쇠날은 굴 껍질을 벗겨내는 날이며, 종질개는 굴의 눈을 문질러 껍질에서 떼어낼 때 쓰인다.
이 굴까는 조새가 천년 전의 난파선에서 2점이 나온바 있다. 1984년과 1985년 사이 전남 완도군 약산도 앞 바다에서 발굴한 도자기 운반선(완도선: 발굴지역의 이름을 따 붙인 이름)에서 3만여 점의 도자기와 함께 이 어로도구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발굴된 조새가 현재 사용되는 것과 거의 같다는 점이다.

[현재 완도지역에서 쓰이는 조새]
이 배는 고려시대 해남 진산리 도요지에서 도자기를 싣고 남해안으로 항해하다 침몰한 난파선인데, 선적품인 도자기의 연대로 보아 11세기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면 완도선 출토 조새는 약 천년 전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배에는 솥·수저·청동밥그릇·시루·숫돌·나무함지 등 선상에서 사용하던 생활용품이 제법 나왔는데, 조새도 그중 하나이다.
돛을 이용한 항해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도중에 포구나 피항지에 정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선원들이 먹을거리를 조달하기 위해 이 조새를 사용해 굴을 채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굴 채취하는 것에 한해서는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도구를 썼다고 볼 수 있다.

[완도선에서 출토된 조새 (쇠날과 종질개 부분은 부식됨)]
이렇듯 하나의 도구가 변하지 않고 사용되는 일은 드문 일인데, 이는 바위에 붙은 굴을 채취하는 작업 특성상 껍질을 쫄 수 있는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바닷가에는 굴이 자라고 있고, 복잡하게 새로운 발명품이 나올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굴채취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물질문화의 요소 중 어떤 것은 사라지고 어떤 것은 남아있는데 이처럼 오랜 기간 생활문화의 영속성을 지니고 있는 조새를 바다에서 찾아내니 바다야말로 ‘문화의 보고’가 아닌가 싶다.
▶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양유물연구과장 곽유석
- 첨부파일
-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