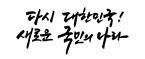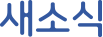- 제목
- 조선왕조실록을 온전히 지킨 단 하나의 사고 전주사고
- 작성일
- 2023-12-01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526
경기전의 거북과 드무
1392년 조선왕조의 성립과 함께 완산유수부가 된 전주에는 전라감영이 설치됐다. 전라감영의 수장인 전라감사(전라관찰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도의 행정, 사법, 군사의 최고 책임자였다. 완산유수부는 1403년(태종 3)에 전주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조선시대에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성이었다는 전주성에는 객사인 풍패지관을 중심으로 서쪽에 전라감영, 동쪽에 전주부영이 자리했다.
태조가 세상을 뜬 뒤에 태조 어진(御眞, 왕의 초상화)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진전(眞殿)이 6곳 세워졌다. 한양의 문소전을 비롯해 경주의 집경전, 개성의 목청전, 평양의 영숭전, 전주의 경기전, 영흥의 준원전이 그곳이다. 1410년(태종 10)에 완공된 전주 경기전(사적)에는 경주집경전의 태조 어진을 본떠 그린 어진을 모셨다. 처음에는 어용전, 태조진전으로 불리다가 1442년(세종 24)에 ‘경기전’으로 명명됐다.
경기전의 중심 건물은 조선 태조 어진(국보)이 봉안된 정전(보물)이다. 태조 어진은 조선 건국 초기부터 6곳의 진전을 포함해 여러 곳에 보관됐다. 그러나 총 26점 가운데 지금까지 남은 것은 전주 경기전 어진이 유일하다. 이 어진은 청색 곤룡포에 익선관을 쓰고 검은 가죽신을 신은 태조 이성계가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다. 곤룡포의 가슴과 어깨에는 왕을 상징하는 다섯 발톱의 용이 그려져 있다.
경기전의 조선 태조 어진은 1872년(고종 9)에 다시 그린 것이다. 원래 경기전에 봉안된 태조 어진을 옮겨 그려서 한양 영희전에 봉안했는데, 그 어진을 다시 옮겨 그린 것이 지금의 어진이다. 경기전 정전에 봉안돼 오던 이 어진은 현재 경기전 뒤편의 어진박물관(증축공사로 휴관 중. 2024년 1월 재개관 예정)에 옮겨 보관 중이다. 정전에는 1999년에 원본을 그대로 옮겨 그린 복제본을 두었다.
경기전 정전은 안정된 구조와 조형 비례, 섬세한 조각과 아름다운 단청 등을 갖춘 전각이다. 조선 태조 어진이 모셔진 전각답게 왕실의 권위와 품격이 엿보인다. 정전 앞쪽에 설치된 정자각 정면의 기와지붕 아래 붉은 널빤지에는 화재를 막아준다는 거북 한 쌍이 조각돼 있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정전 뜰의 신도 양옆에도 화재 진압용 물을 담아두는 드무가 나란히 놓여 있다.
전주사고의 건립 과정
조선왕조에서 처음 편찬된 실록은 1409년(태종 9)부터 1413년(태종 13)까지 4년에 걸쳐 완성된 태조실록 15권이다. 1426년(세종 8)에는 정종실록 6권, 세종 13년에는 태종실록 36권을 편찬했다. 이렇게 편찬된 실록은 똑같이 2부씩 만들어 서울 춘추관과 충주사고에 봉안했다. 하지만 2부의 실록만으로는 완벽하게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1445년(세종 27) 다시 2부씩 더 만들어서 신설된 전주사고와 성주사고에 각 1부씩 보관했다. 전주사고의 설치는 일찍이 1438년(세종 21)에 결정됐다. 『세종실록』 86권을 보면, 1438년 7월 3일 ‘춘추관에서 아뢰기를 “청하옵건대, 경상도 성주와 전라도 전주에 사고를 지어서 전적을 간직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1445년(세종 27)에 추가 제작된 태조에서 태종까지의 실록이 도착할 때까지도 전주사고의 실록각은 건립되지 않았다. 전주사고에 내려 보낸 실록은 전주성 안의 승의사에 임시로 안치됐다가 1464년(세조 10) 가을에 전주객사 뒤쪽의 진남루로 옮겨졌다. 1472년(성종 3), 세종실록과 예종실록이 완성되자 조정에서는 동지춘추관사 양성지를 실록 봉안사로 임명해 전주에 파견했다.
전주에 도착한 양성지가 전라감사 김지경과 협의해 그해 겨울부터 전주사고 건립공사가 시작됐다. 이듬해인 1473년 5월 전주사고 실록각이 경기전 동쪽에 준공됐고, 그해 8월부터는 역대 임금의 실록이 차례대로 실록각에 봉안됐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할 당시의 전주사고에는 실록 784권 614책 47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등을 비롯한 전적 64종 556책 15궤가 봉안돼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이 내장산으로 옮겨진 까닭
1592년(선조 25) 4월 13일(음력)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함으로써 임진왜란이 시작됐다. 그로부터 불과 20일 만에 한양 도성이 왜군의 수중에 들어갔고, 6월 13일에는 평양성마저 함락됐다. 임진왜란 이전에 세워진 사고도 전주사고를 제외한 3곳 모두 전란의 와중에 불타버렸다.
전주사고의 실록만 온전히 보존된 데는 경기전 참봉이었던 오희길, 정읍 태인의 두 선비인 안의와 손홍록의 공이 매우 컸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오희길은 태조의 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태조 어진과 실록을 내장산으로 피란시키기로 결정하고, 태인현(지금의 정읍시 태인면)에 사는 손홍록을 찾아갔다. 오희길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손홍록은 동문수학한 안의와 함께 30여 명의 인력을 대동하고 전주 경기전으로 달려가 태조 어진과 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겼다.
그 당시 64세의 유생이었던 안의는 전주사고의 조선 태조 어진, 실록, 고려사 등을 여러 차례 옳기면서 지켜낸 370여 일간의 과정을 『수직상체일기』에 매일 기록했다. 그 일기에 따르면, 1592년(선조 25) 6월 22일 내장산 은봉암으로 옮겨진 실록은 7월 14일 비래암으로 옮겨졌고, 7월 1일 용굴암에 옮겨 놓은 태조 어진은 9월 28일 다시 비래암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이듬해인 1593년 7월 9일까지 1년여 동안 내장산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조실록』 과 태조 어진 등은 정읍, 태인, 익산, 부여, 청양, 아산, 강화도 등을 두루 거쳐 정유재란이 끝난 뒤인 1603년 묘향산사고에 보관됐다. 조정에서는 안의와 손홍록에게 6품 관직인 ‘별제’를 내렸으나 끝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내장산 단풍이 절정기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한 10월 말에 조선왕조실록 이안길을 걸었다. 내장사에서 용굴암까지 편도 1.5km의 이 길은 ‘실록길’로도 불린다. 실록, 어진 등이 보관됐던 용굴암, 은봉암, 비래암 등의 터는 근래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됐지만, 용굴암 외에는 찾아가기가 어렵다.
작은 계곡의 물길을 옆구리에 끼고 이어지는 조선왕조실록 이안길에서는 실록1교부터 실록8교까지 8개의 나무다리를 건너게 된다. 이안(移安, 신주나 영정 따위를 딴 곳으로 옮겨 모심) 과정을 재현한 조형물이 근래 곳곳에 세워져서 오가는 길의 여정이 더 풍성해졌다. 탐방객의 발길도 뜸해서 호젓한 정취를 오롯이 즐길 수 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60여 개의 궤짝을 나눠서 짊어지고 이 깊고 거친 산길을 오르내렸을 선인들의 노고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저절로 깨닫게 마련이다.
글, 사진. 양영훈(여행작가, 여행사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