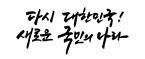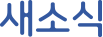- 제목
- 석탑의 원형은 무엇일까?
- 작성일
- 2023-10-31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504
목탑에서 석탑으로
우리나라는 불교 전래 이후 사찰을 건립할 때 목탑을 조성했다. 그렇지만 내구성과 화재에 취약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서기 600년경을 즈음한 시기에 재료의 전환을 가져왔다. 즉, 탑을 건립함에 있어 오랜 시간 채취에서 가공에 이르기까지의 기술력이 축적된 석재에 주목됐다. 이로써 기존에 나무로 탑을 조성하던 조탑공(造塔工)들은 이때부터 석재로 탑을 조성해야 했고, 이에 따라 대두된 많은 문제점을 목탑을 건축하며 축적된 기술력으로 해결했다.
석탑에 구현된 목조건축의 요소
석탑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기단부·탑신부·상륜부이다. 그중 목조건축의 요소가 짙게 배어 있는 부분은 바로 기단부와 탑신부이다. 목조건축은 기단을 구비하고, 이에 개설된 계단을 통해 건물의 내부로 진입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석탑에도 기단부가 있어 목조건축과 동일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단을 구성하는 면석에는 우주(隅柱)와 탱주(撐柱)로 불리는 기둥이 표현되어 있다. 이 같은 면면은 기단 상면에 놓인 갑석과 더불어 실제 건축의 하중을 받기보다는 시각적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를 통해 목조건축과 석탑의 기단이 양식과 기능 면에서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조건축에서는 기단이 완성되면 초석을 놓고 벽체를 구성한다. 석탑에서는 바로 탑신이 이에 해당하는 부재이다. 그런데 탑신에는 모두 우주로 불리는 2개의 기둥만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목조건축에 비해 기둥 수가 적은 이유는 좁은 공간에 여러 개의 기둥을 표현해 시각적으로 답답함을 주기보다는 면석의 양 끝에만 기둥을 표현해 자칫 번잡하게 처리될 벽면을 단순하면서도 넓은 느낌을 받도록 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와 더불어 석재로 만든 탑신에 감실(龕室)과 문비형(門扉形)을 부조해 목조건축에서와 같이 공간이 있음을 구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탑신은 단순한 돌덩어리에서 벗어나 내부 공간을 지닌 건축물로서 실체가 구현된 것이다.
목조건축은 단층으로 건립되지만, 여러 층을 지닌 누각(樓閣)의 형태로도 건립된다. 그 때문에 다층 목조건물에서는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높이와 너비가 차츰 줄어드는 체감비(遞減比)를 지니게 된다. 아울러 1층에 비해 2층의 높이가 현격히 낮아지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같은 목조건축의 특징은 석탑에 그대로 재현되어 탑신부에 구현된 체감비는 목조건축의 양식과 일치하고 있다. 그 때문에 석탑은 바로 고층 누각의 형상을 석재로 재현한 것임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목조건축에서는 기둥 위에 공포(栱包)를 놓고 지붕을 구성한다. 이때 처마와 합각선의 완벽한 처리로 경쾌한 반전미와 더불어 날렵하고 장중한 지붕을 구성하게 된다. 석탑의 옥개석은 바로 목조건축의 지붕에 해당한다. 옥개석의 하면에는 각형(角形)의 받침이 조출되는데, 이는 목조건축의 포를 직선과 각으로 단순하게 처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목조건축의 포를 그대로 재현한 중국 전탑의 옥개석과 달리 복잡한 공포를 단순하게 조성하면서 옥개석에 단순함과 장중함을 함께 주는 기법을 탄생시켰다. 그와 더불어 옥개석에 구현된 완만한 낙수면과 수평으로 이어지는 처마선과 전각에서 이루어지는 경쾌하고 날렵한 반전은 목조건축의 지붕과 동일한 양식을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석탑 발전사에서 이 같은 조형미를 가장 완벽하게 재현한 석탑은 불국사 삼층석탑이다. 이 석탑의 옥개석에 구현된 완만한 경사면과 처마선, 이와 조화를 이룬 전각의 반전은 가히 목조건축의 지붕을 그대로 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다. 아울러 목조건축에서 지붕선이 맞닿은 면에 기와를 올려 두툼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수법은 백제시대에 건립된 미륵사지와 정림사지 석탑에 구현되어 있고, 고려시대에 등장하는 백제계석탑(百濟系石塔)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탑은 신앙의 상징물 이전에 건축물이었다. 따라서 단순히 돌을 깎아 쌓아 올린 구조물이 아니라 일정한 규율에 따라 건립되었고, 내외형적으로는 목조건축의 요소가 충실히 배어 있다. 우리나라의 조탑공들은 석재로 탑을 조성했지만, 실제로는 나무로 집을 건축하는 마음으로 단단한 화강암을 일일이 다듬어 건립했던 것이다.
글, 사진. 박경식(단국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