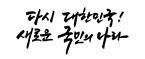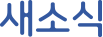- 제목
- 모두가 힘들었지만 인정이 넘쳤던 그 시절
- 작성일
- 2023-09-26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243
대통령관저가 된 도지사 관사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 발발 직후에는 방어태세를 미처 갖추지 못한 국군이 잠시 수세에 몰렸다. 하지만 가을바람이 불어올 즈음부터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특히 1950년 9월 15일에 국군과 유엔군이 감행한 인천상륙작전은 북한군의 허를 찌르며 단번에 전황을 바꿔 놓았다. 낙동강 전선에서도 총반격 작전을 개시한 국군은 마침내 9월 22일과 23일에 걸쳐 북한군의 낙동강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수세에 몰린 북한군은 모든 전선에서 다급히 후퇴하기 시작했다. 국군은 여세를 몰아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했고, 10월 27일에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다시 서울로 옮겨졌다.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10월에 평양, 원산, 함흥을 점령하고 압록강과 청천강까지 진격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중공군의 개입으로 11월 30일부터 철수를 가속화했다. 압록강을 건너온 중공군의 대공세로 인해 국군과 유엔군은 남쪽으로 후퇴를 거듭했다.
1951년 1월 4일에는 서울을 적들에게 다시 빼앗기고 말았지만 3월 15일 재탈환에 성공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1951년 1월 3일에 부산을 다시 임시수도로 정한 정부는 이튿날인 1월 4일에 부산으로 급히 이전했다. 이승만 대통령도 부산으로 다시 내려와 정전협정의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 15일까지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사적)에서 생활하면서 집무를 수행했다.
‘임시경무대’로도 불리는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는 일제강점기인 1926년에 부산시 부민동에 건립되었다. 2층 규모의 이 건물은 외벽에 붉은 벽돌을 쌓고, 내부는 일본식 목구조를 부분적으로 적용한 형태로 지어졌다. 본관 건물 말고도 지하실, 부속창고 등의 부속건물을 갖추었다. 6·25전쟁으로 인해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로 사용된 3년을 제외하고는 1926년부터 1983년까지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로 활용됐다. 1984년에는 임시수도기념관으로 다시 꾸며져서 지금까지 이어온다. 건립된 지 오래된 건물인데도 옛 모습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다.
다양하게 변신을 거듭한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에서 북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내에는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국가등록문화재)가 있다. 가는 길에 지나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건물 앞에는 부산 전차(국가등록문화재)가 전시돼 있다. 1927년 미국 신시내티차량회사에서 제작돼 애틀랜타에서 운행되다가 1952년 무상원조로 우리나라에 도입돼 1968년까지 부산에서 운행된 전차이다. 부산에서 실제 운행한 전차 가운데 유일하게 남았다.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는 1925년 4월 진주에서 부산으로 옮겨진 경남도청 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처음 건립됐다. 서구 르네상스 양식과 일본 목조 양식이 결합된 이 건물은 처음에 ‘ㅡ’자 모양의 평면으로 건축됐다. 훗날 증·개축되면서 ‘ㅁ’자 모양, ‘8’자 모양으로 바뀌었다. 6·25전쟁 당시 30여 개월 동안 임시수도 정부청사로 사용된 때를 제외하고는 1925년부터 1983년까지 경남도청 청사로 쓰였다.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된 이듬해인 1984년부터 2001년까지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지방검찰청 청사로 사용되기도 했다. 2002년에 이 건물을 매입한 동아대학교는 2009년부터 석당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피란민들이 소막에서 살게 된 이유
6·25전쟁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약 16만 명의 피란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다. 인천상륙작전 직후에 수복한 서울을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떠나야 했던 1·4후퇴 때에는 무려 26만여 명의 피란민이 부산에 새로 유입됐다고 한다. 정부와 부산시는 극장, 공장, 여관, 일반주택 등을 피란민 수용시설로 활용했지만, 엄청난 피란민에 비해 수용시설은 턱없이 부족했다. 수용시설에 들어갈 수도 없고 셋방 구할 형편도 안 되는 피란민은 스스로 살 집을 마련해야 했다. 주인 없는 공터나 산비탈, 바닷가에 얼기설기 판잣집을 짓거나 한때 소막이었던 시설을 임시 거주지로 재활용했다.
부산의 대표적인 피란민 마을 가운데 하나인 부산시 남구 우암동 일명 ‘소막마을’은 원래 한적한 바닷가 마을이었다. 일제가 조선의 소를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1909년 이곳에 이출우검역소(移出牛檢疫所)를 설치한 뒤부터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검역소 주변에는 한꺼번에 1,400~1,600마리의 소를 수용할 수 있는 소막사 19동과 소각장, 창고, 사택 등 건물 40여 동도 함께 지어졌다. 해방 이후 이출우검역소의 업무가 중지되자 이곳의 소막은 잠시 비기도 했다.
그러다 일본에서 귀환한 동포들이 비좁고 창문도 없는데다 햇빛조차 들지 않는 소막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작은 마을이 만들어졌다. 6·25전쟁 당시에는 더 많은 피란민이 몰려들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거제도 등지에서 임시로 머물던 피란민들까지 이곳에 들어와 자연스레 ‘피란민 마을’이 형성됐다. 고도성장의 산업화시대에 들어와서는 근처 목재공장이나 부두에서 일하는 영세 노동자들의 생활공간이 됐다.
현재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국가등록문화재)과 마을의 규모는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과 비좁은 골목, 지붕 위에 불쑥 솟은 환기창 등의 옛 모습은 여기저기서 쉽게 발견된다. 옛 정취가 진하게 느껴지는 골목길을 걷다가 우연히 ‘부산 밀면의 원조’라는 오래된 냉면집을 발견했다. 마침 시장했던 참이라 비빔밀면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고 나왔다. 내친 김에 냉면집 근처의 동항성당에도 들렀다. 소막마을과 부산항 제7부두가 훤히 보이는 산중턱에 자리한 이 성당은 1951년 임시 천막 성당으로 출발했다.
1959년에 하 안토니오 신부가 부임한 뒤로는 소막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임산부를 위한 조산원과 어린이집 같은 탁아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소막마을 주민들의 자립을 도왔다고 한다.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과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등을 포함해 ‘한국전쟁기 피난수도 부산의 유산’ 9곳은 2023년 5월에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다. 조만간 세계유산에 등재됐다는 희소식이 전해 오기를 기대해 본다.
글, 사진. 강훈(자유기고가)
- 이전글
- 극치를 향해 가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