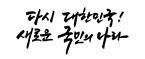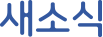- 제목
- 조선시대 전기 왕실 원찰, 성남 갈현동 사지 발굴조사
- 작성일
- 2023-09-26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433
도심 가까이에서 새로 찾아진 유적
갈현동 사지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탄천을 거쳐 광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갈현(葛峴), 갈마치(葛馬峙)]에 가까이 있어 옛 교통로였으며, 지금도 동-서, 남-북 방향의 여러 도로가 연결되는 곳이다. 성남시의 북쪽 구도심과 남쪽 신도시를 잇는 여러 도로 가운데 한 터널 위에서 갈현동 사지가 최근에 새로 찾아졌다. 돌로 쌓은 여러 단의 축대가 많은 기와와 함께 드러나 있어, 이곳에서 농사를 짓던 몇몇 사람들은 옛 흔적이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꽤 높은 산지에 송전·변전시설과 가까이 있어 개발을 피하였고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 주민의 발견 신고에 따라 현지 확인과 유적의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졌고, 석축의 규모와 쌓은 모습이 범상치 않아 곧바로 발굴조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 2021년에 시작된 발굴은 2022년까지 유적의 범위와 건물 분포의 기초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고, 2023년에는 본격적으로 유적의 중심부에 대한 정밀발굴이 진행되었다. 입구부터 금당(金堂)1)까지의 중앙부 그리고 금당이 위치한 가장 윗단의 건물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하였고, 주변의 건물과 나머지 시설에 대한 조사는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발굴될 예정이다.
10여 동의 건물이 정연하게 배치된 큰 규모의 사찰
석축을 쌓아 만든 3단의 대지에 여러 건물이 배치되었으며, 사찰에서 사용되는 많은 범자(梵字, 산스크리트문자) 막새기와가 출토되어 절터였음을 알 수 있었다. 유적 가장 안쪽의 3단 대지에는 금당지와 동서 건물지, 동쪽 석축 확장 구역의 건물지까지 4동이 배치되었다. 2단 대지에는 금당지 바로 앞에 중정(中庭)이 있고, 중정을 바라보고 있는 동서 건물지, 그리고 가장 바깥쪽의 건물지들이 배치되었다. 1단 대지의 중심부에는 절로 들어서는 문지(門址)와 돌이 깔린[박석(薄石)] 보도가 있고, 동서 끝부분에 건물지와 기와가마 등이 확인되었다. 각 석축을 올라가기 위한 돌계단이 설치되었고, 2단 대지의 중정 앞쪽에는 중문(中門)과 보도를 겸하는 장랑(長廊)이 동-서로 길게 만들어졌다. 10여 동의 건물이 정연하게 배치된 비교적 큰 규모의 사찰이며, 건물의 배치가 조선시대 전기의 여러 사찰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금당지를 비롯하여 중심부에 배치된 건물은 모두 정면과 측면이 3칸 규모인데 측면은 가운데 어칸(御間)이 넓고, 앞뒤 퇴칸(退間)이 좁은 형태이다. 금당 부분의 석축은 앞으로 약간 돌출되어 이곳이 가장 중심이 되는 곳임을 나타내었다. 금당 주변에서 토수(吐首)2) 기와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팔작지붕으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3단 대지의 동쪽 끝부분에 배치된 건물은 다른 건물들과 차이를 보이는데, 금당지처럼 석축이 앞으로 돌출되었고, 동쪽 측면에 함실아궁이를 두어 온돌을 설치하였다. 동서 측면과 앞면을 담장으로 둘러막고, 전용 출입계단을 따로 두었으며, 측면 담장 출입문에서 금당 동쪽 건물로 건너가도록 징검다리 디딤돌이 놓였다. 면이 고르게 다듬어진 화강암 장대석으로 서쪽 측면 기단을 만들어, 사용된 석재에서도 높은 위계의 차별성을 드러내었다.
고려시대 사찰을 조선시대에 중창한 것으로 판단
석축 위에 10여 동의 건물이 배치된 모습이 갈현동 사지의 가장 마지막 모습이며, 출토유물로 보면 15~16세기의 조선시대 전기에 해당된다. 두세 곳에서 석축이 확장되는 양상이 확인되므로 시차를 두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조금씩 넓힌 것으로 보인다. 16세기에 폐사된 이후로는 다시 활용되지 않았는데, 조선시대 전기의 주요 사찰들은 대부분 후대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소실과 재건이 반복되어 당초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갈현동 사지는 상부의 건축물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훼손되지 않은 조선시대 전기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 자료이다.
금당지가 위치한 3단 대지 석축과 2단 대지 중정 사이에는 정면 5칸 규모의 초석(楚石)이 한 줄로 배치되어 있는데, 두 번째 열에 해당되는 양 측면 초석 2매가 석축과 계단 아래에 중첩되어 있어 선후관계로 이해된다. 전체 사역의 중심축 안쪽에 위치하며 석축 하부에 놓여 있으므로, 앞선 시기의 사찰 금당이 정면 5칸 규모로 있던 것을 조선시대 초에 크게 중창하여 축대 위로 올려 다시 건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정의 토층을 살펴보면 편평한 대지를 만든 후 두 차례의 운영 시기가 확인되어 각각 금당의 변화 모습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시대의 청자와 기와가 최초의 대지조성 층에 쓸려 들어간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었던 사찰을 조선시대 초에 중창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모습은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삼아 건국한 조선에서 억불정책을 펴면서 새로운 절을 만들지 못하도록 통제하였으므로, 필요한 경우 이전부터 있었던 절을 활용하였던 여러 사례와 일치한다.
왕실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 출토
많은 양이 출토된 기와류와 함께, 금당지 주변에서는 보통의 사찰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마루장식기와 종류가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용마루의 양 끝에 놓이는 취두(鷲頭) 3), 내림마루의 끝이나 추녀마루 안쪽에 놓이는 용두(龍頭), 추녀마루 앞쪽을 장식하는 잡상(雜像)의 여러 종류가 모두 출토되었다. 취두는 숭례문에 놓였던 것과 비교되며, 용두와 잡상은 왕실 사찰인 양주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
또한 막새기와의 문양은 사찰이었음을 알려주는 범자문(梵字文), 연화문(蓮花文)이 많고, 왕실 관련 건물에서만 사용되는 용문(龍文) 수막새, 봉황문(鳳凰紋) 암막새도 소량 확인되었다.
또한 궁에서도 주요 건물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었던 청기와가 1점 출토되었으며, 대단히 많은 양의 마연(磨硏)기와4)가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특히 전기에 각종 마루장식기와와 청기와, 용·봉황문 막새 등은 궁궐이나 왕릉 관련 건물처럼 왕실과 관련된 곳이 아니면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므로, 이 사찰이 일반적인 사찰과는 달리 왕실과 관련된 곳이었음을 알려준다.
왕실과 관련되었음을 알려주는 또 다른 자료로 집수시설이 있다. 구멍이 뚫린 판석으로 집수구(集水口)를 만들고 암거(暗渠)를 따라 배출되는 배수로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집수구는 경복궁과 창덕궁, 회암사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궁궐의 기술자가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광주 일대에는 왕릉 이외에도 여러 대군과 공주의 무덤이 만들어졌는데, 특히 성남시 구도심 일대에 해당되는 세촌면(細村面)에는 후손 없이 죽은 대군과 공주가 주로 매장되었다. 1674년에 요절한 현종의 두 딸 명선·명혜공주를 위한 원찰(願刹)5)로 봉국사(奉國寺)를 창건하였던 것처럼, 갈현동 사지도 조선시대 전기에 왕실 인물을 기리기 위한 원찰로서 이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위하여 운영되었던 것인지는 아직까지 문헌이나 출토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밝혀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1) 금당(金堂): 절의 본당으로 본존불을 모신 건물
2) 토수(吐首): 지붕의 처마 네 모서리에 돌출된 목재인 추녀를 보호하고 장식하기 위해 끼워지는 기와 또는 금속
3) 취두(鷲頭): 격식이 있는 건물의 용마루 양쪽 끝부분에 올리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기와
4) 마연(磨硏)기와: 기와의 외부에 노출되는 면을 매끈하게 갈아내어 장식성과 기능성을 높인 기와로서,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아련와(牙鍊瓦)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5) 원찰(願刹): 소원이나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건립하는 불교 사원
글, 사진. 김환일(중앙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