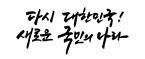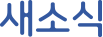- 제목
- 궁궐 내 어진 봉안처
- 작성일
- 2023-08-31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366
궁궐 안의 진전, 선원전
조선 전기에는 개성, 영흥, 평양, 경주, 전주 등에 태조 어진을 모시는 진전(眞殿)이 있었고, 서울에는 경복궁 안에 선왕의 어진과 왕실족보인 『선원록』을 봉안하는 선원전이 있었다. 이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전쟁을 겪는 중에 대부분 파괴되었다. 숙종 때부터 어진을 모시는 장소를 새로 만들고 국왕의 초상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였는데, 그 결과 지방에는 태조 어진을 모신 영흥의 준원전과 전주의 경기전이, 한양에는 태조, 세조, 원종의 어진을 모신 영희전이 있게 되었다. 또한 숙종은 1695년(숙종 21)에 제작한 자신의 어진을 강화도 장녕전과 창덕궁 선원전에 보관하게 하였다.
이후 창덕궁 선원전에는 영조, 정조, 순조, 문조, 헌종의 어진이 차례로 봉안되면서 건물 증축도 이루어졌다. 1868년 고종이 중건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창덕궁 선원전의 어진들은 경복궁 선원전으로 옮겨졌다가, 1897년 대한제국의 법궁인 경운궁(현재의 덕수궁)으로 옮겨져 1900년 새로운 선원전에 다시 모셔졌다. 고종은 경운궁 선원전에 태조 어진도 모사하여 봉안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여러 곳에 있던 어진들을 덕수궁으로 모두 모았다가, 1921년 창덕궁에 12개 감실을 갖춘 신선원전을 지어 이 어진들을 모두 옮겼다. 창덕궁에는 경복궁으로 옮기기 전 어진들을 모셨던 구선원전과 1921년에 경운궁 선원전을 헐어다 지은 신선원전이 모두 남아있다. 이곳에 모셨던 어진들은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란갔다가 1954년에 일어난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었다. 남은 어진들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화재로 인해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어진은 몇 점 되지 않는다.
경희궁 태령전
숙종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어진을 제작하고 이를 궁궐 안 선원전과 강화도의 장녕전에 각각 봉안함으로써 현임 국왕의 어진 봉안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한 이후, 영조는 이를 이어받아 10년마다 어진을 그리는 것을 정례화하고 어진 봉안 장소를 여러 곳으로 확대하였다. 영조는 자신의 어진을 13점 남겼고 그중 7점을 궁궐 안에 봉안했는데, 그곳이 경덕궁(현재의 경희궁) 태령전이다. 창덕궁 내에 숙종의 어진을 봉안했던 선원전이 정전인 인정전의 왼편에 있었던 것과 유사하게, 태령전은 영조의 집무공간인 정전 숭정전과 편전 자정전 바로 왼편에 위치하였다. 영조가 연잉군이던 1714년(숙종 40) 숙종의 명으로 그려 받은 초상을 보관한 것을 시작으로, 1733년(영조 9)에 제작한 영조 어진 2본과 1744년(영조 20) 제작한 면복본 대본 1점을 태령전에 봉안하였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연잉군 초상>이 1714년 숙종의 명으로 그린 영조의 21세 상으로, 즉위 전엔 창의궁에, 즉위 후에는 태령전에 보관되었다가, 1778년(정조 2) 창덕궁 선원전에 봉안되었다.
육상궁 냉천정
청와대 옆, 조선 국왕을 낳은 7명의 후궁의 사당이 모인 칠궁에도 어진봉안처가 있다. 영조는 1744년 세 점의 어진을 제작했는데 이 중 면복 차림의 대본은 경덕궁 태령전에, 곤룡포 차림의 대본은 강화도 만녕전에, 곤룡포 차림의 소본은 육상궁 냉천정에 봉안되었다. 육상궁은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1670-1718)의 사당으로 냉천정은 육상궁 왼편에 위치한 재실 건물이다. 영조의 어진은 대청 서쪽 온돌방 벽에 걸려 대청을 열면 육상궁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조어진〉은 이때 육상궁에 봉안된 영조 51세 때 곤룡포 차림의 소본 어진을 1900년에 모사한것이다.
영조 생전에 육상궁 냉천정에 봉안된 어진으로는 영조의 61세 어진(1757년 제작) 1본과 80세 어진(1773년) 1본이 더 있었다. 영조는 자신의 어진을 냉천정에 둔 것에 대해 생모를 항상 옆에서 모시려는 뜻이라 밝힌 적이 있다. 자신의 효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 그 장소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인 것이다. 영조는 왕위에 오르기 전 살았던 창의궁에도 어진을 봉안하였다. 이렇게 영조는 국왕의 권위를 그대로 담은 어진을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장소에 나누어 봉안함으로써 그 장소를 후대에까지 특별하게 만들었다.
창덕궁 주합루
영조가 어진 봉안을 통해 장소의 권위를 높인 방식을 정조 역시 활용하였다. 정조는 1781년(정조 5) 어진을 그리면서 관련 업무를 모두 규장각에서 담당하게 하고 이때 완성된 대·소 곤룡포본 2점을 규장각 주합루에 봉안하였다. 정조가 자신의 어진을 주합루에 둔 것은 숙종이 선원전에, 영조가 태령전에 그들의 어진을 보관했던 사례를 따른 것이다. 규장각은 정조의 국정운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어진 제작, 봉안, 관리를 규장각에서 담당하며 이 과정을 의례로 규정함으로써 규장각의 위상을 높이고 자신의 어진이 가지는 권위도 높이고자 했다. 규장각은 역대 임금의 글과 글씨, 각종 도서를 수집, 정리, 편찬하는 곳이며 정조 이후 어진 봉안처로도 자리잡아 1830년(순조 30) 당시 대리청정하던 효명세자는 부왕 순조의 어진을 제작하여 규장각에 봉안하였다.
1791년에 제작된 정조 어진은 규장각 주합루와 아버지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 망묘루,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륭원 재실에 나누어 봉안되었다. 영조와 마찬가지로 정조는 자신의 어진을 친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보이고, 그의 사당과 무덤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 활용했다. 1800년 순조는 규장각 주합루에 봉안되어 있던 정조어진과 현륭원 재실에 있던 정조어진을 화성행궁으로 옮겼다. 어진은 단순히 왕의 얼굴을 재현한 초상화가 아니라 임금의 분신이었다. 조선의 국왕이 자신의 분신을 남겨놓고자 했던 곳임을 알면 그 장소의 의미가 또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글. 이홍주(궁능유적본부 학예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