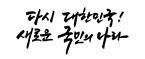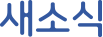- 제목
- 조선 왕실의 권위와 영원한 지속을 표상하다
- 작성일
- 2019-07-02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2139
어보에 새겨진 위호(位號, 여러이름)
조선의 어보에는 역대 왕과 왕비에게 올린 여러 이름들을 새겼다. 그 내용에는 왕비, 세자, 세자빈 등 책봉명만 새긴 것부터 왕과 비의 업적을 칭송하는 이름인 존호(尊號), 승하 이후 왕과 비의 행적을 기리는 이름인 시호(諡號), 종묘에 신위(神位)를 모실 때 붙이는 이름인 묘호(廟號), 왕비의 성품을 기리는 이름인 휘호(徽號) 등이 있다.
존호를 새긴 존호보는 살아있는 국왕 뿐 아니라 왕실의 선조에게도 올려졌다. 태조 이성계를 비롯하여 많은 국왕들이 존호를 받았는데 조선후기로 갈수록 정치사와 연관되며 그 수가 늘어났다. 이는 유교적 사고방식이 깊어질수록 왕의 공덕을 문자로 찬양하는 관행이 점점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선대를 기리는 존호를 계속 더해 올리며, 그때마다 어보를 또 새겼는데 먼저 올린 존호까지 합쳐서 어보에 새겨진 글자의 수가 100자가 넘는 예도 찾아 볼 수 있다.
왕실 의례와 어보, 어책
위호를 새긴 어보는 임금을 비롯한 왕실 인물들의 각종 의례를 위해 제작한 인장이다. 따라서 나라의 여러 공무에 사용하는 관인(官印)인 국새(國璽, 玉璽)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책봉 의례의 경우, 그 대상은 왕비를 비롯하여 왕세자, 왕세제, 왕세손과 그 빈들에 해당한다. 왕세자, 왕세제, 왕세손의 책봉은 공식적으로 왕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선포의식이었다. 국왕의 자리를 이을 아들이나 손자 등은 국본(國本)으로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왕세자나 왕세손에 책봉되는 전례(典禮)를 거쳐야 했다. 이 때 공식적으로 이를 승인하는 의물로 책봉보인과 교명, 책을 수여하였는데, 이러한 의물들은 해당 인물을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물이었다. 임금의 책봉 명령을 적은 교명은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훈유하는 내용으로 말미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었다.
국왕이 사망하면 국장도감에서는 시책과, 결정된 시호보를 제작하여 행사에 대비하였다. 이후 왕이나 왕비의 삼년상을 마치고 나면 신주를 종묘에 모시게 되는데 이 때 묘호보를 제작하여 종묘에 봉안하였다. 조선의 어보는 신위와 함께 나라와 왕실을 지키는 상징이 되었다. 종묘의 신실은 신주함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보장(寶欌)을 두어 어보를, 서쪽에는 책장(冊欌)을 두어 어책을 봉안하였다.
이처럼 어보와 어책은 왕실 인물들의 책봉과 등극, 국장과 종묘에 이르기까지 일생의 전환기에 치러지는 주요 의례를 위해 제작되고 보관되었다. 어버이와 선조의 공덕을 높이고, 효라는 유교윤리를 실천하는 한편 왕실의 전통을 드러내는 성스러운 예물로서 자리했던 것이다.
어보와 어책의 제작
왕의 어보는 최상품질의 옥이나 금 두 가지 재질로 만들고, 왕비로 책봉되면 옥이나 은에서 금으로 바꾸어 제작했는데, 금보는 주로 금속에 도금(鍍金)한 것이다. 어보의 글은 전문사서관이 쓰고 이를 사자관이 베낀 후 각 재료에 북칠사자관 또는 북칠화원이 어보 인면에 새길 글자를 내려앉힌다. 이후 각장이 새겨 보문을 완성 하였다. 아울러 어보를 보호하고 장식하기 위한 각종 상자를 비롯하여 보자기, 끈, 열쇠, 자물쇠 등 많은 부속물이 함께 제작되었는데, 이를 통해 왕실공예의 종합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조선시대 의궤의 기록에 의하면, 제작에 참여한 장인의 수는 적게는 20여명, 많게는 50명이 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어보의 제작 뿐 아니라 보통, 보록, 호갑(護匣), 자물쇠 등의 제작에도 참여하였다. 금보는 주조의 비중이 높고 옥보는 조각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옥을 다루는 장인과 금은을 다루는 장인을 구분하여 기용했다.
어책 또한 신분과 재질에 따라 옥책·죽책·금책으로 구분한다. 책의 글은 문장력이 뛰어난 제술관이 작성한다. 제술관은 높은 직위와 가문, 학식, 명망을 고루 갖추어야 했으며, 글씨를 쓰는 서사관 또한 정 3품 이상의 품계와 명망을 지녀야 했다. 실제 제작에는 40~50여명의 장인들이 세분화된 체계에서 업무를 분장했다.
교명은 조선 초기에는 종이에 먹으로 글을 쓴 일반 문서 형태였으나, 세종 19년(1437)에 중국의 제도에 따라 비단으로 장황하고 축을 갖춘 두루마리 교명을 처음으로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직물로 격을 높여 제작한 교명을 축(軸), 즉 두루마리로 장황함으로써 왕실 주인공에 수여하는 문서를 일반관리들의 문서와 차별화 하였다.
어보와 어책의 장식
어보는 상서로운 동물인 거북이나 용모양의 손잡이를 갖추었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거북이형 손잡이가 제작 되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신하의 도리를 상징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제국기에는 황제국을 천명하고 용형의 손잡이를 만들었다. 제작이 완성된 어보는 이중으로 보관하게 된다. 직접 어보를 담는 통을 보통(寶筒)이라 하고 보통을 담는 외함을 보록(寶盝)이라 한다. 무늬 없이 붉은 칠만 한 보록도 있으나, 보록의 앞면에는 주로 두 마리의 승룡을 금니로 그렸으며 이는 대한제국기까지 지속된다. 여의주를 아래쪽이나 가운데 두고 얼굴과 꼬리를 맞대고 있는 두 마리 승룡 도상은 왕뿐 아니라 왕비, 왕세자의 보록에도 그려졌다.
교명의 양식은 전대의 것과 중국의 『대명회전』을 참조하였는데, 1609년 교명축의 무늬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보면 “고명의 양식은 오색 삼베실이나 명주실로 만드는 것으로 전면에 ‘봉사고명(奉使誥命)’이란 글자를 수 놓는 것이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용의 무늬가 좌우로 서려 있으며 …… 그 무늬에 있어서 관복의 꽃무늬가 품계의 높낮이에 따라 다른 것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어 문식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옥책의 경우 가장자리 꾸미개인 변철(邊鐵)에는 만초문이 주로 사용되다가 고종대에 들어 쌍룡문이 등장한다.
이처럼 대한제국 성립 이후 어보와 변철에 용을 시문하는 변화가 보이지만, 보록과 교명, 변철에는 시대를 거치며 큰 변화 없이 일관된 장식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식들은 위의 기록에서 제시한 것처럼 품계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용도가 아니라 왕실의 권위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으로 작용했다.
세계 문화속의 어보와 어책
어보와 어책은 과거 중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된 책봉제도(冊封制度)의 유산이다. 그러나 조선은 중국에서 내리는 시호를 사용하지 않고 왕과 신료들의 상의 아래 결정된 존호와 시호를 어책과 어보에 새긴 것으로 자국의 주체성을 드러냈다. 또한 건국이후 57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보와 어책을 제작·봉헌하고 보존해 온 긴 여정을 통해 조선에서 꽃핀 유교문화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한편 보수적이면서도 엄격한 왕실의 전통을 담은 성스러운 의물이면서도 어보에 표현된 조각 및 기타 부속품들의 제작 기법, 어보와 어책, 교명에 쓰여진 글의 내용과 문장의 형식, 글씨체 등에는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어 매우 가치가 높은 기록문화유산이라 할수 있다.
글. 김주연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