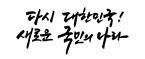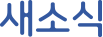- 제목
- 승탑, 단순한 구성에 투영된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
- 작성일
- 2019-05-30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2070
선인선과(善人善果) 악인악과(惡人惡果)
죽음은 살아 있는 생명체에는 피할 수 없는 절대평등의 이치지만, 인간이 지닌 가장 근본적인 고민 중 하나이다. 불교에서 죽음에 대한 고민은 현실로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삶에도 번민하지 않고 죽음에도 번민하지 않는 생명을 추구한다. 즉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것은 불교가 기본적으로 ‘윤회’ 사상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최상의 자세는 당연히 윤회로부터의 해방이다.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선인선과(善人善果) 악인악과(惡人惡果), 즉 선의 종자를 많이 심으면 다음 세상에서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의 종자를 많이 심으면 다음 세상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삶을 두려워해야 한다. 죽음은 삶의 연장이자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불교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生死不二)’라고 강조한다. 해탈하지 않는 한 중생은 끝없이 윤회한다. 불교 상장의례는 해탈을 위한 방편이다. 죽은사람 에게 번뇌와 업장을 소멸하고 해탈해 윤회고를 벗어나 불생불멸하기를 바라는 의례이자 망자를 위한 법회이다.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의례에 동참한 산 사람도 해탈·열반에 이르기를 염원하는 의식이다. 이같은 이유로 불교 상장의례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뭇 중생의 관조와 깨달음을 촉구하는 법문으로 이어진다.
승려의 장례문화
불교의 장례는 ‘다비(茶毘)’이다. 인도에서는 시신을 불에 태우는 화장(火葬), 숲에 안치하는 임장(林葬), 갠지스강 물속에 버리는 수장(水葬), 빈터에 놓아두는 기장(棄葬) 등 여러 장례법이 행해졌다. 화장(火葬)은 불교에서 다비(茶毘)라고 불린다. 『입세아비담론(立世阿毘曇論)』에는 소장(燒葬), 수장(水葬), 매장(埋葬), 기장(棄葬) 등 고대 인도 장례법이 나온다.
한반도의 화장은 춘천 교동 등 신석기시대 동굴 유적에서 불에 탄 사람 유골이 발견됐는가 하면 보령댐 수몰지역인 보령 평라리 유적에서도 화장 흔적이 있었다.『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신라 자장(慈藏) 스님의 장례를 다비로 치렀다는 기록이 있다. 12세기에 이르러서야 다비가 정착되었다. 조선시대 배불(排佛)로 억압받던 중에도 출가자는 모두 다비로 장례를 치렀다.
승탑의 시작은 통일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도를 만들어 스님의 사리를 봉안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신라 말에 도입된 선종 불교의 발전과 관련이 깊다. 선종 불교는 법을 전해주고 이어받은 스승과 제자, 또 다음 세대의 스승과 제자의 활동에 의하여 법맥이 성립된다. 선종이 유행하면서부터 조사 또는 스승의역할이 중요시되었고, 그들의 자리를 승탑이라는 무덤을 만들어 봉안하고 섬기게 되었다. 승탑은 승려의 사리를 봉안한 무덤으로 부처의 사리를 봉안한 탑보다는 규모가 작다. 탑은 부처의 상징이므로 경내의 중앙부에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면, 승탑은 격이 낮은 사찰의 어귀나 뒤편 등 조용한 곳에 모아 세우는데 이곳을 부도전 또는 부도밭이라 부른다.
입적뒤에 남은 안식처, 석조승탑
우리나라에 승탑이 처음 세워진 곳은 선문 9산의 각 선문에서 각기 사자상승(師資相承)함으로써 각 산문에는 개산조와 개산인의 순서로 일종파의 계보가 이루어진다. 이에 각 선문의 제자들은 소속 종파가 확정되면서 그들의 조사를 숭봉하여 보통 때 그가 설법한 내용이나 교훈 등을 어록으로 남기고, 입적 뒤에는 장골처를 남기려는 뜻에서 조성된 것이 석조승탑이다. 승탑은 대체로 선종이 처음 들어온 통일신라 말기부터 널리 세워지게 되었고 고려시대 이후 선종의 발달과 함께 크게 유행 한 것으로 보면 된다.
이러한 석조승탑은 대개 9세기 중반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가장 오래된 승탑은 9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양양 진전사지 도의선사 승탑(보물 제439호)과 원주 흥법사지 염거화상탑(국보 제104호)을 통해 승탑 양식의 계통을 추정한다. 도의선사 승탑은 기단부가 신라 석탑의 기단부를 모방하였고, 그 위의 탑신부는 팔각형으로 만들었다.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시대 초에 걸쳐 승탑은 팔각원당형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지게 되었다. 2단의 기단은 각 면마다 우주와 중앙에 탱주를 새기고, 그 위로 탑신을 괴기 위한 8각의 돌을 두었고 옆면에는 연꽃을 조각하여 둘렀다. 8각의 기와집 모양을 하고 있는 탑신은 몸돌의 한쪽 면에만 문짝 모양의 조각을 하였을 뿐 다른 장식은 하지 않았다. 지붕돌은 밑면이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으며, 낙수면은 서서히 내려오다 끝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위로 살짝 들려 있다.
9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원주 흥법사지 염거화상탑은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팔각원당형 승탑이다. 염거화상은 도의선사의 제자로 우리나라 선종의 제2조로 꼽힌다. 염거화상탑은 844년에 축조되면서 이후 대부분의 승탑은 이 양식을 따르고 있다. 아래위 각 부분이 8각의 평면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기단이 하대석·중대석· 상대석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면에 연꽃을 장식한 조각이 멋스럽게 펼쳐져 있다. 하대석에는 사자를 돋을새김하였고, 중대석은 측연화문을 새기고 가운데에 향로를 새겼다. 2단으로 마련한 상대석의 하단에는 앙련을 두 줄로 돌려 우아함을 살리고 윗단에는 면마다 측연화문을 새기고 안에 여러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탑신의 몸돌 8면에는 문짝 모양과 사천왕상을 번갈아가며 배치하였는데, 입체감이 있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지붕돌은 당시의 목조건축양식을 잘 따르고 기왓골과 기와의 끝마다 새긴 막새기와 모양, 밑면의 서까래 표현 등은 실제 건물의 기와지붕을 보고 있는 듯하다. 상륜부는 모두 없어졌다.
고려시대에는 승탑의 양식이 다양해지고 팔각원당형을 기본으로 하여 다른 형태의 승탑이 만들어진다. 전체가 사각으로 된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국보 제101호)과 기단이나 지붕돌은 팔각이지만 몸돌은 공 모양의 원형인 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실상탑(국보 제102호), 그릇을 거꾸로 엎어놓은 듯한 모양의 태화사지 십이지 상승탑(보물 제441호)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석종형 승탑이 주류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승탑은 신륵사의 보제존자석종(보물 제228호)으로 기단은 돌을 쌓아 높게 만들고 탑신은 아무런 꾸임이 없고, 꼭대기에는 머리 장식으로 불꽃무늬를 새긴 큼직한 보주가 솟아 있다.
승탑에 새긴 다양한 문양 중에 연꽃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극락에 가서 연꽃 속에 다시 태어나려는 극락왕생의 염원을 담은 의미를 갖는다. 또한 사자가 승탑의 기단석에 조각되어 있는 모습은 수많은 번뇌와 망상인 사악한 무리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악귀를 물리치는 용감한 수호신이다. 통일신라시대부터 시작된 가릉빈가는 영원히 망자를 기리도록 하려는 뜻이다. 생사의 순환을 계속하면서 부처님이나 고승대덕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음악신을 대신하여 영원한 음악을 만든다. 이 밖에도 신장상, 비천상,물고기, 두꺼비, 거북 등을 조각하여 죽은 사람에게 번뇌와 업장을 소멸하고 해탈해 윤회고를 벗어나 불생불멸하기를 바라는 의례를 담고 있다.
글. 정진해 (한국능력교육개발원 교수)
- 이전글
- 간결함 속의 심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