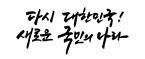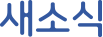- 제목
- 초기 철기시대 첨단기술의 결정판
- 작성일
- 2019-05-30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2147
설계·제도 된 거푸집, 새김 방법이 다른 거푸집
국보 제231호 전 영암 거푸집 일괄(이하 국보 거푸집)은 우리나라 청동기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물로 11종 26점의 청동기 주형이 새겨져 있는데, 청동검(細形銅劍), 청동꺾창(銅戈), 청동투겁창(銅矛), 도끼(有肩銅斧), 장방형 도끼(長方形銅斧), 조갯날 도끼(蛤刃銅斧), 끌(銅鑿), 지우개(銅鍦), 바늘(銅針), 낚싯바늘 (釣針), 거울(銅鏡) 등이다.
국보 거푸집은 현재 일괄 유물로 알려져 있지만 거푸집을 만드는 데 사용된 돌의 재질이나 주형(鑄型)의 설계·제도와 새김 방법을 보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 거푸집들은 두 짝을 맞춰서 사용하는 쌍합범(雙合范)들이 많기 때문에 양쪽에 새겨진 기물의 주형이 꼭 들어맞아야만 청동기를 제대로 주조할 수 있다. 그래서 정밀한 설계·제도 기술이 필요하다. 국보 거푸집들을 보면, 돌의 색상이 흑청색과 흑갈색을 띠는 것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흑갈색 거푸집들은 흑청색 거푸집들보다 주형을 설계·제도할 때 자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빈도가 높아졌지만 좌우를 결합할 때의 정밀도는 떨어졌다. 그뿐 아니라 흑청색 거푸집들의 주형은 각진 새김이어서 가장자리 윤곽이 뚜렷하지만 흑갈색 거푸집들은 모죽임 새김을 선호해서 가장자리 윤곽이 덜 뚜렷하다. 한국 청동기문화의 거푸집들을 보면,설계·제도할 때는 자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며, 새김 방법은 각진 새김에서 모죽임 새김으로 변해간다. 국보 거푸집에는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는 2개 군의 거푸집들이 섞여 있는 것이다.
1000°C 이상의 고온에서도 깨지지 않는 돌, 활석
국보 거푸집을 비롯한 한국 청동기-초기 철기시대의 거푸집들은 대부분 활석(滑石)으로 만들어졌다. 왜 거푸집을 활석으로 만들었을까? 거푸집은 청동기물을 주조하는 물건으로 1000°C 이상의 고열을 순간적으로 받기 때문에 도중에 터지거나 깨져버릴 위험이 있다. 주조하는 도중에 거푸집이 파손되면 제대로 된 주물을 얻을 수 없다. 초창기 고고학자들은 활석으로 청동기 주조실험을 하면서 거푸집이 터져버릴까 걱정하였다고 한다. 청동기물이 제대로 주조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고온의 쇳물이 튀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우려는 기우였다.
거푸집의 재료인 활석의 성질은 2013년에 필자가 활석과 각섬석암으로 각각 거푸집을 만들어 주조실험을 해보면서 더 잘 알게 되었다. 활석은 우리나라 거푸집들이 대부분 활석이기 때문에 선택하였다. 각섬석암은 장수곱돌로 더 잘 알려진 돌인데, 일부 거푸집들의 재질이 이 돌로 알려져 있었을 뿐 아니라 이 돌은 열에 강해서 현재도 돌솥이나 고기구이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활석과 각섬석암 거푸집에 각각 청동창의 주형을 새겼다. 각섬석암 거푸집은 첫 번째 주조 후에 0.5㎝ 정도 크기로 3~4군데가 깨져나갔지만 한 번 더 사용해도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두 번째 주조실험을 진행했는데, 주형이 심하게 파손되면서 주조에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활석제 거푸집은 다섯 번을 주조한 후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활석제 거푸집으로 한국 청동기들을 여러 번 복원하였던 이완규 주성장(鑄成匠)은 활석제 거푸집으로 청동검을 30번가량 주조해봤는데, 그때까지도 거푸집이 멀쩡했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활석제 거푸집은 하나를 가지고 청동검이나 청동 투겁창을 수십 개, 또는 백 개까지도 주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보거푸집의 고향은 영암일까?
국보 거푸집은 영암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진다. 돌려 이야기하면 영암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1960년경 고 매산 김양선 교수가 국보 거푸집을 수집했을 때 영암에서 출토된 것이라고 전해 들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3년 화순 백암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마을 사람들이 무덤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청동검과 청동꺾창 등을 수습해서 신고한 것이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급히 수습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거의 다 파괴되기는 했지만 고운무늬거울(精文鏡) 등을 더 수습하였고, 이 유물들이 모두 초기 철기시대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도 알게 되었다. 필자도 전공자여서 현장에 가보았고 유물들도 관찰했다. 필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청동꺾창에서 내(內)라고 불리는 자루를 끼우는 부분이었다. 백암리 청동꺾창의 내가 동일한 형식의 다른 청동꺾창들보다 0.3~0.5㎝정도 좁아 보인 것 이다. 필자는 국보 거푸집에 있는 청동꺾창의 주형을 보면서 항상 “왜 저렇게 청동꺾창의 내가 좁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백암리 청동꺾창의 좁은 내가 눈에 확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국립광주박물관과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의 도움을 받아 두 유물을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였다. 그리고 화순 백암리에서 수습 된 청동꺾창이 국보 거푸집의 청동꺾창 주형에서 주조된 것을 밝히고, 이를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도 없던 일이었다. 2300년 만에 거푸집과 거푸집에서 주조된 청동기가 다시 만나는 순간 이었다. 그리고 국보 거푸집의 고향이 밝혀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물론 국보 거푸집의 고향을 영암으로 확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영암도, 화순(백암리)도 모두 영산강유역 안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보 용범의 고향은 영암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영산강유역 안에 있는 어느 지역일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은 분명하다.
글. 조 진선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 한국청동기학회 회장)
- 다음글
- 철의 왕국, 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