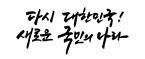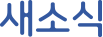- 제목
- 하회별신굿탈놀이로 본 양반과 서민의 격식과 파격
- 작성일
- 2012-08-14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4164

양반 마을의 풍자 서민극 탈놀이
안동 하회마을은 과거 지배계층을 주도했던 화려함을 말해주듯이 마을을 끼고 S자로 굽이 돌아 흐르는 낙동강과 강변의 사장沙場, 곳곳에 들어서 있는 기와집과 정자 등으로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룬 반촌班村이다. 중요민속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되어 있는 하회마을은 풍산豊山 류씨 柳氏 동성同姓 마을로 지난 2010년에는 경주 양동 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풍산 류씨는 조선조 선조宣祖임금 때의 명신名臣이며, 이순신을 조정에 천거한 것으로 유명한 류성룡柳成龍을 비롯한 많은 유학자와 정치가를 배출한 전통적인 양반가문이다.
양반은 늘 격식이 우선하지만, 이 마을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파격이 이루어질 때가 있었다. 정월대보름, 하회별신굿탈놀이를 할 때였다. 오늘날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로서 우대받지만 애초에는 하회마을 서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는 ‘동반자’였다.
하회 탈놀이는 농작의 풍작을 기원하는 굿에서 시작된 것으로 다른 탈놀이가 그렇듯이 양반이 즐기는 놀이가 아니다. 양반의 그늘에서 살아야 했던 서민들의 놀이였기에 그들이 전승주체가 되었다. 탈놀이는 강신(降神, 대내림)과정에서 시작하여 무동마당, 주지마당, 백정마당, 할미마당, 파계승마당, 양반·선비마당, 당제, 혼례마당, 신방마당, 헛천거리굿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강신降神, 당제堂祭, 서낭제, 헛천거리굿 등의 의식儀式과 함께 비의秘儀로 진행되는 혼례마당과 신방마당을 제외한 6개 마당으로 구성된다. 제외된 몇 마당은 하회별신굿탈놀이가 당제라는 종교적 의례와 함께 전승되어 온 것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의 기원이 풍농 기원굿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회별신굿탈놀이는 탈을 쓰고 노는 극이다. 극에서 배우와 대사, 그리고 공연장소는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탈놀이에서는 배우를 광대, 공연장소를 탈마당 또는 마당이라고 한다. 서양연극에서 연기자는 전문적인 배우지만 탈놀이의 광대는 마을 사람이다. 이들은 농사를 업으로 하다가 탈놀이가 있으면 일손을 놓고 광대가 된다.
탈놀이의 대사는 원래 기록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말로 전해지기에 상황에 따라 즉흥적인 기지나 재치가 쏟아진다. 서양식 무대는 배우들이 연극행위를 하는 곳으로 정형화되고 관중은 무대를 일방적으로 향하는 곳에 위치하게 된다. 하지만 탈놀이의 공연장은 이와 다르다. 그래서 공연장소를 무대라 하지 않고 마당이라고 한다.
마당의 종류도 다양하다. 집마당, 동네마당, 배꼽마당 등 마당을 끼고 있는 건물이나 주변 환경의 형태에 따라 또는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진다. 그러므로 마당은 일정한 형태가 없는 자유로운 공간이다. 탈놀이가 이처럼 자유로운 공간에서 연행되기에 광대도 구경꾼도 자유롭다.

평상시의 하회마을은 반상의 구별이 엄격한 곳이다.
탈놀이는 지배층이 아닌 피지배층이 행하던 놀이이며 연희자는 이른바 일반 백성이다. 일반 백성과 같은 신분일 수 없는 양반들도 이때만은 좋든 싫든 동참한다.
탈춤 대사의 가변성은 서민들의 욕구를 말로나마 분출시키는 기회를 준다. 평소 양반 앞에서 입도 뻥긋 못했던 이들이 탈을 썼다는 구실로 양반을 풍자하고 선비도 골탕 먹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민은 그간 억눌렸던 감정을 카타르시스한다.
공연장소의 자유로움도 엄격한 반상의 구별에서 해방시켜준다. 하회탈놀이는 동사洞舍 앞마당이나 초청하는 대가大家집 마당에서 놀았다. 마당이라고 했지만 이 경우 대단히 큰 집이어야 한다. 특히 여섯 마당을 놀 수 있는 집은 서애西厓 류성룡 선생댁과 형님인 겸암謙庵 류운룡柳雲龍 선생댁과 같은 대가여야 하며 그 외의 집에서는 마당이 좁아서 놀 수가 없다. 비록 ‘초청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는 붙지만 평소 대가大家 문전에 얼씬도 못했던 서민들은 탈놀이를 할 때만은 마음 놓고 들어가서 쇳소리도 낸다.
쇳소리는 풍물 치는 소리를 말한다. 하회마을에서는 다른 마을과는 달리 별신굿을 할 때 이외에는 풍물을 울릴 수가 없었다. 이웃마을인 풍산면 수동水洞의 별신굿 때에도 풍물이 화려하게 등장하는데 하회와는 달리 1년 내내 수시로 풍물을 칠 수 있었다. 하지만 하회의 경우는 탈놀이가 끝나면 쇳소리를 내지 못하는 엄격한 신분사회로 돌아간다.
그런데 탈놀이를 할 때에는, 심지어 선비광대가 대청에 올라가서 양반과 직접 대면하며 수작을 걸고, 풍자적인 사설로 골려주기까지 한다. 이러한 까닭에 양반댁에서 마당 빌려주기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다.
0404 중요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밀양 백중놀이의 특징은 상민과 천민들의 한이 전체놀이에 익살스럽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병신춤과 오북춤은 밀양에서만 전승되어 오고 있으며 배김내사위는 이 놀이의 주된 춤사위로 춤동작이 활달하고, 오른손과 오른발이, 왼손과 왼발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특이하다. 밀양백중놀이 또한 반상이 소통하고 격식을 파괴한 놀이의 하나다.

격식과 파격의 동행은 반상班常의 소통
탈놀이 각 마당은 노골적인 풍자가 중심을 이룬다. 그런 가운데서도 양반을 극명하게 풍자하는 마당으로 양반·선비마당을 꼽을 수 있다.
양반·선비마당에는 양반, 선비, 이매, 초랭이, 백정, 부네, 할미 등 일곱 명의 광대들이 등장하는데 놀이판이 큰 만큼 대사가 풍부하고 재담과 익살이 넘친다. 이 마당을 이끌어 가는 주인공은 양반의 하인인 초랭이다. 초랭이의 신분은 비록 하인이지만 재담과 재치가 번뜩이는 똑똑한 하인이다. 양반과 선비가 서로 자신의 지위(결국 가문의 우월성)와 학식이 낫다고 우긴다. 선비가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다 읽었다고 뻐기자 양반은 이에 질세라 자기는 사서삼경의 곱인 팔서육경八書六經을 다 읽었다고 한다. 선비가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팔서육경이 무엇이냐고 묻자 초랭이가 냉큼 나선다. 그리고는 육경六經이 팔만대장경, 중의 바라경, 봉사의 안경, 약국의 길경, 처녀의 월경, 머슴의 쇄경[새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요리조리 뛰어다닌다. 양반은 머슴도 아는 육경을 선비라는 자가 모르냐고 다그친다. 결국 두 사람의 싸움은 구경꾼에게 창피만 당하고 피장파장으로 끝나버린다.
싸움이 끝나고 양반이 부네를 부르자 또 서로 부네를 독점하려고 애쓴다. 그때 백정이 등장하여 양반과 선비에게 우랑牛囊을 팔려고 한다. 지체 높은 두 양반이라 처음에는 상스럽게 여기다가 백정이 양기에 좋다고 하자 서로 자기가 먼저 사려 했다고 우기면서 우랑 쟁탈전을 벌인다. 이에 백정도 합세하자 서로 맞잡았던 우랑이 땅에 떨어지고 할미가 등장하여 떨어진 우랑을 주워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우는 양반과 선비, 백정을 싸잡아 풍자한다. 이때 이매가 등장하여 “환재[환자=還子] 바치시오”라고 외치자 모두 깜짝 놀란다. 두 번째 외치면 그 자리에서 벌벌 떨고 세 번째 외치면 허겁지겁 도망가 양반·선비마당도 끝이 난다.
환자는 조선조 때 나라에서 춘궁기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추수 때 곡식을 돌려받는 구민제도였다. 그러나 환관들의 횡포로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오히려 백성들을 더욱 곤궁에 빠지게 하였다. 환재 바치라는 소리로 탈놀이를 끝낸다는 데서도 서민과 다른 신분층인 타락한 관리를 풍자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탈놀이의 대사는 현실의 불만과 갈등을 예리하게 심화시켜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양반과 선비가 우랑을 가지고 싸우는 낯 뜨거운 장면, 그것도 양반의 큰 마당에서 벌이는 장면은 가히 파격의 일미이다. 양반·선비마당이 끝나면 탈놀이도 끝이 나고 이제 비로서 일상으로 돌아와 전과 같은 격식이 갖추어진다.
행세만 하는 것이 양반이 아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귀담아, 격식과 파격을 동행하여 반상班常을 소통하는 양반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이 아닐까?
글·김명자 안동대학교 민속학과명예교수,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사진·문화재청
- 이전글
- 표지 이야기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