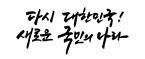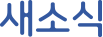- 제목
- 웃음으로 상실의 슬픔을 달래는 문화, 진도 다시래기
- 작성일
- 2012-08-14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4126

유교적 엄숙주의와 다른 파격, 축제식 상장례풍속
상가에서는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문상객들을 대접하고 주민들은 그것을 먹으며 밤을 새워 논다. 또한 무당을 불러 굿을 하고, 노래와 춤을 추고 윷놀이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튿날 운상을 할 때는 상여 행렬 앞에서 풍물을 치며 상여소리를 부르고 간다. 또한 마을 부녀자들이 상여에 ‘길베(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길을 상징하는 긴 무명 또는 베)’를 매달아 어깨에 메고 운상 행렬을 이끌고 가면서 상여소리를 부르고, 쉴 참에는 놀이판을 벌이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논다. 장례를 치르는 전 과정이 음악과 노래, 놀이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축제식 상장례는 유교적 엄숙주의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모습을 처음 본 이들은 상식과 다른 상가 풍경을 보고 놀란다. 흔히 상가에서는 슬퍼하고 애도해야 하며 또 엄숙해야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엄숙하지 않은 행위는 무례한 것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그렇게 보면 상가에서 굿판을 벌이고 장구치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모습은 충격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교식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의 영향에 힘입어 엄격한 절차와 격식을 강조하는 장례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유교식 상·장례에서는 상복을 준비하고 입는 과정과 각종 제상 차림, 시간 맞춰 이뤄지는 갖가지 의례를 중시한다. 한편 절차와 격식을 강조하는 장례 모습은 조선중기 이후에 향촌사회에 널리 퍼진 것일 뿐 본래부터의 유일한 풍속은 아니다. 유교가 유입되기 이전부터 지속돼 오던 다양한 전통이 남아 있기 마련이다. 상가에 가보면 애도의 분위기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술판이 만들어지고 한쪽에서는 윷놀이와 화투판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도시의 장례식장에서도 밤샘하며 술 마시고 화투판을 벌이고 노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현대사회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이 약화된 현상에 해당된다. 요즘 들어 바쁜 일상에 쫓겨 살면서 장례가 약식화 되고 있고, 관련 놀이가 장례식장의 화투판처럼 잔존화 되어 있지만 얼마 전만 해도 밤샘을 하면서 상주를 위로해 주고 놀아주는 전통은 일반적인 풍속이었다. 지금은 공동체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마을에서 볼 수 있지만, 춤과 노래로 상주를 위로하고 죽은 자를 보내는 풍속은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노래와 춤과 연극으로 죽은 이를 보내는 전통
우리의 축제식 상장례풍속은 유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지속돼 온 민족적 양식이다. 『수서隋書』 동이전 고려(고구려)전에 의하면, “처음과 끝에는 슬퍼하며 울지만, 장례를 하면 곧 북을 치고 춤추며 음악을 연주하며 죽은 이를 보낸다初終哭泣 葬卽鼓舞作樂以 送之.”라고 적고 있다. 이 기록은 진도에서 풍물을 치며 춤과 노래로써 운상하는 현재의 모습과 흡사하다. 또한 조선시대 기록에서는 ‘상가에서 술과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고 노래판을 성대하게 벌이고 놀았는데 이를 오시娛屍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어버이를 장사하는 날에 신을 즐겁게 한다는 명목으로 무당을 불러 와서 술을 마시고 풍악을 베풀어 하루를 다하고 밤새도록 하지 않는 짓이 없다.’라고 적고 있기도 하다. 조선시대에는 상층에서는 유교식 예법에 근거해 민간의 장례풍속을 폐풍弊風이라고 하고, 민중들은 상층의 유교식 장례를 박장薄葬이라고 하면서 공방하기도 했다. 여하튼 이 과정을 거쳐 지배계층이 주도하는 유교식 예법이 널리 퍼지고, 전래의 축제식 장례 방식은 축소되었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
최근까지도 각 지역마다 상가의 놀이가 전승되었다. 장례놀이는 특정 지역에서만 전승되는 특이한 민속이 아니다. 출상 전날 밤에 상두계원들이 빈 상여를 메고 상여소리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노는 놀이는 전국적으로 전승된다. 황해도에서는 이를 ‘생여돋음’이라 하고, 강원도·경기도에서는 ‘손모듬’ 또는 ‘걸걸이’라고 한다. 또한 경상도에서는 ‘대돋음’이라고 하고, 전라도에서는 ‘상여어르기’ 또는 ‘밤달애’, ‘대울림’ 등으로 부른다.
다시래기는 진도에서 전승되는 장례놀이다. 진도 다시래기는 우리의 오래된 장례풍속의 모습을 잘 담고 있고 연극적인 짜임새가 각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시래기라는 말의 어원은, ‘다시나기(다시 낳다)’, ‘다시락(多侍樂;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즐긴다)’에서 나왔다고 설명된다. 이와 같은 뜻풀이는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 상황과 연결돼 있으므로 예사롭지 않은 풍속임을 말해준다. 또한 다시래기의 이칭으로 ‘대시待時레기’라는 말이 있는데, ‘망자의 영혼이 집에 머물다가 떠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노는 놀이다.’라고 풀이된다.

성적인 재담과 출산 : 상실을 극복하는 연극적인 설정
다시래기의 연행내용을 보면, ①가상제놀이 ②거사·사당놀이 ③상여놀이 ④여흥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에서 ①과 ②가 연극적으로 특히 흥미를 준다. 가상제놀이에서는 가짜 상주가 등장하여 놀이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어 등장인물들이 차례로 나와서 자신의 특기를 자랑한다. 그리고 거사·사당놀이에10서는 거사·사당·중의 삼각관계가 펼쳐진다.
다시래기는 배우들의 재담도 그렇고 동작 하나하나가 파격적이어서 관심을 끈다. 눈이 먼 거사는 과장되게 눈을 깜빡이면서 지팡이를 앞세우고 우스꽝스럽게 등장한다. 그리고 관객을 향해 소변을 보겠다고 하고, 볼일을 본다고 앉아 있다가 뒤로 자빠져서는 배설물을 만지고 냄새 맡는 흉내를 내면서 재담을 한다. 그 부인 역은 여장 남자가 맡는데, 볼과 입술 등에 붉은 화장을 하고 붉은 색 속옷이 드러나도록 치마를 들쳐 입고 활갯짓을 하면서 춤을 춘다. 행색이나 동작 모두 웃음거리다. 거사는 임신한 사당의 배를 만지며 자장가를 부르고, 이어 애가 나왔다고 가정하고 애 골격을 가늠하자고 하면서 담뱃대를 손으로 짚어가며 더듬어 보는 시늉을 한다. 머리로부터 가슴, 배, 하체로 내려오며 생김새를 주워섬기는데, 사당이 아들인가 딸인가를 묻자 “말도 말게 헌 조개가 새 조개 낳았네.”라고 하면서 성적인 표현을 서슴치 않는다.
다시래기의 하이라이트는 사당과 거사가 나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고 또 중이 얽혀 삼각관계를 연출하고 가무를 즐기다가 아이를 낳는 장면이다. 출산은 다시래기의 어원을 풀어주는 장면이라고 할 만큼 각별한 의미가 있다. 등장인물들의 우스꽝스러운 행색과 더불어 성적 표현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아이 출산 놀이를 하는 것은 단순히 흥미를 위한 것이 아니다. 거침없는 욕설과 과장된 언행은 상가에서 벌어지는 연행에 탄력을 부여한다. 다시래기에서 성적 사설과 행위에 이어 아이 낳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성이 죽음과 맞서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죽음의 자리에서 성을 얘기하고 출산 놀이를 하는 것은 죽음을 부정하고 삶을 긍정하는 뜻이 있다. 상주를 위로하고 달랜다는 표층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죽음의 결손을 생명 탄생으로 극복해간다는 문화적 수용태도를 담고 있다.
축제식 상장례와 다시래기는 슬픔과 웃음이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상집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노는 것은 죽음을 문화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특히 성적인 재담을 주고받고 아이 출산을 연출하는 것은 죽음과 배치되는 연극적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시래기는 죽음으로부터 비롯된 상실의 아픔을 웃음과 신명의 활기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연극이라고 할 수 있다.
글·이경엽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교수 사진·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이미지투데이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