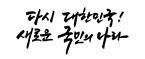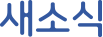- 제목
- 방 안에서 우산 쓰는 정승, 하정夏亭유관柳寬
- 작성일
- 2012-08-14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4738

고려부터 조선까지 8대 왕을 모신 관료
유관은 고려 말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1371, 26세)하여 조선 세종 때까지 활동한 문신이다. 본관은 문화인으로 자는 경부敬夫, 호는 하정夏亭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유관은 고려 말기에 이미 전리정랑, 전교부령을 거쳐 성균사예, 사헌중승(종3품) 등을 역임하였다. 그가 공조총랑이 되었을 때 이성계가 조선의 왕위에 올랐다. 유관은 즉위식을 행하는 동안 왕의 뒤에서 칼을 들고 호위하는 운검雲劒의 책임을 맡아서 좌우에서 떠나지 않았다. 즉 유관은 이성계를 도와 조선 개국에 참여한 개국원종공신이다.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는 내사사인으로서 태조에게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의하였다. 이후 승진을 거듭하여 태조6년(1397)에는 좌산기상시·대사성에 올랐다. 태종원년 유관은 다시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다. 태종 11년에는 예문관 대제학이 되어 《통감》 및 《대학연의》와 《춘추》를 왕에게 강하였다. 세종 8년(1426) 1월에 우의정에 임명되고 그대로 치사致仕하였다. 유관이 81세 때이다.
인권과 인간의 도리를 중시한 공명정대한 판관
유관은 형조전서의 직책에 있을 때 죄인의 자복自服을 받기 위하여 고문拷問을 하는 관행을 없앨 것을 건의하였다.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강하고 사납고 굳세고 과단성이 있기도 하며, 유순하고 나약하고 겁이 많기도 하여 같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도둑질을 하고도 그 매질을 견디어 마침내 공초供招에 승복承服하지 않기도 하며 혹은 무고誣告를 당하고도 매질의 고초를 참지 못하여 거짓 자복自服하기도 하니 진실과 거짓은 정말로 분변하기 어렵습니다.
형벌을 맡은 관리는 다만 자복시켰다는 명목만 힘쓰고 생명의 중함을 돌보지 않고서, 법에서 정한 것 외의 형벌을 설치하여 온갖 방법으로 신문하여 죄가 드러나기도 전에 몸이 이미 곤장 아래에서 죽게 되니, 정말로 도적질 한 자라도 만약 공초에 승복하지 않고서 죽었다면 죄를 판결하는 데 혐의가 있을 것인데, 하물며 죄도 없이 생명을 잃게 되면 원통하고 억울함이 어찌 적겠습니까?”라며 법외의 형벌을 일체 금지하고 함부로 고문하지 못하게 하도록 건의하였다. 임금은 이를 받아들여 시행하게 하였다. 형조전서는 죄인을 다스리고 법률을 세우는 직책이지만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당시에는 아직도 처첩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고, 관원들이 처를 두셋씩 두는 사례가 많았다. 이 경우 본인이 죽은 후에 아들들이 적자嫡子문제로 다투게 되어 쟁송이 제기되었다. 유관은 적자문제에 대한 판결기준을 정하는 상소를 올렸다.
“세월이 이미 오래 되어서 혼인서가 있는지 없는지 혼례를 올렸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분간하기가 곤란합니다. 무릇 처가 있는데도 처를 얻는 자를 규찰할 법조문이 없습니다. 처가 있는 자가 다시 후처를 얻으면 선처와 후처의 자식은 서로가 적자嫡子라고 주장하는데, 양반의 자식은 후취後娶를 첩牒이라 일컫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처첩의 자식이 적자嫡子를 다투는 경우에는 선후를 논하지 말고 조사하여 밝혀 결정하소서. 노비는 처첩의 예例에 의거하여 차등 있게 나누고, 세 명의 처를 모두 데리고 산 자는 선후를 논하지 말되 그 중에 죽을 때까지 동거하는 자에게 작첩爵牒과 전지와 노비를 주면 3처妻의 자식이 고르게 분급分給할 것입니다.”
이 상서를 보면, 작첩을 주거나 재산을 분배할 때 가장 으뜸 되는 것은 끝까지 같이 산 자, 은의가 두터운 자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는 아직 성리학의 명분 질서가 고착화 되기 전 조선초기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모호한 판결에서 유관은 인간의 03 전라남도 기념물 제105호 영팔정. 영팔정은 고려말∼조선초 문신인 하정 유관(1346∼1433)이 주위 경치에 감탄하여 아들 맹문에게 시켜 조선 태종 6년(1406)에 지은 정자이다. 04 경기도 기념물 제62호 유관선생묘.030430도리나 의리를 기준으로 삼았다.
세종은 즉위한 후 교서를 내려 신하들에게 진언을 하게 하였다. 이때 유관은 예문관 대제학으로서 수령들이 선정善政을 베풀도록 건의를 올렸다. 왜냐하면 당시의 지방 수령들이 자기 권위만 세우고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빨리 다른 데로 승진해 갈 생각만 하고 있는 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수령이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백성이 잘 살게 되고 못 살게 되는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근래에 수령이 모두 사무 처리하는 것만으로 일을 삼고, 형벌을 엄하게 함으로써 위엄을 세우려 하며, 압박하고 재촉함으로써 일을 거둬 치우는 데만 힘을 쓰고 백성의 이해에 대하여는 일찍 돌아보고 생각해 주지 아니합니다.…그런데 감사監司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처리 잘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높은 등급으로 고과考課를 매깁니다. 그러므로 뒤에 그 후임을 맡은 사람도 그대로 본받아 하게 되니 백성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으며 그들의 원망을 풀어 낼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각도에 명령을 내리시어 수령들로 하여금 모두 백성을 사랑할 것을 염두에 두고 각박한 짓을 하지 않도록 힘써서, 원망의 기운을 없애게 하옵소서.”
검약과 절제를 실천한 재상
그는 궁정에서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이고 술 마시는 것을 금하고 왕의 탄일에 조회에서 축하하는 것, 초례醮禮를 행하는 것을 없애자고 건의하였다. 이는 유관이 향락과 허례적인 의식을 좋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유관의 성품은 온량하고 돈후하였다. 또 자질이 밝고 민첩하였으며 풍채가 빛나 네 명의 임금을 연달아 섬겼으되 모두 사랑을 받았는데 특히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 유관의 생활태도는 검약하고 소박하였다. 그의 집이 흥인문 밖에 있었는데 『고려사』를 편찬하는 책임을 맡았다. 이 일은 금륜사에서 하였는데 그 절은 성안에 있었다. 유관은 지춘추관사의 책임을 맡고서 간편한 사모紗帽에 지팡이 짚고 걸어서 다니며 수레나 말을 쓰지 않았다. 어떤 때는 동자와 관자 몇 사람을 이끌고 시를 읊으며 오고가니 사람들은 그가 재상인줄도 몰랐다. 유관은 학식이 높아 벼슬이 정승에 이르렀어도 제자들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 생도가 매우 많았다. 공무에서 물러나온 뒤에는 더욱 제자들이 모여들었는데 누구라도 와서 뵈면 고개를 끄덕일 뿐이요, 그들의 성명도 묻지 않았다.
매양 시향時享에는 제생에게 음복을 시켰는데 소금에 절인 콩 한 소반을 서로 돌려 안주를 하고는 질항아리에 담은 탁주로써 그가 먼저 한 사발을 마시고는 차례로 좌상에 한두 순배를 돌리었다. 손님을 위해서 술을 접대할 때도 반드시 탁주 한 항아리를 뜰 위에다 두고는 늙은 여종으로 하여금 사발 하나로써 술을 치게 하여 각기 몇 사발을 마시고는 끝내 버렸다.
그는 우의정이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생활은 청렴하고 반듯하여 초가집 한 칸에 베옷과 짚신으로 담박하게 살았다. 누구라도 찾아오면 겨울에도 맨발에 짚신을 끌고 나와서 맞이하였고, 때로는 호미를 가지고 채소밭을 돌아보기도 하였다.
그의 초가집 밖에는 울타리도 담장도 없었다. 태종이 선공감을 시켜서 몰래 밤중에 울타리를 치게 하고 또 어찬御饌을 끊이지 않게 내렸다. 한 번은 장맛비가 오래 계속되었다. 집안에 비가 새어 삼[麻]줄기처럼 줄줄 내렸다. 유관은 손에 우산을 받쳐 들고 비를 받으면서 앉아서 부인을 돌아보고 말했다.
“나처럼 우산도 없는 집에서는 어떻게 견디겠소.” 하니 부인은, “우산 없는 집엔 다른 준비가 있답니다.” 하니 빙그레 웃고 말이 없었다. 그 뒤부터 마을사람들이 그의 집을 우산각이라 불렀으며 이 마을을 우산각리雨傘閣里라 하였고, 뒷날 음이 변하여 우선동遇仙洞이 되었다고 한다.
세종의 애도
세종 15년 5월 7일에 유관이 졸卒하자, 임금이 부음을 듣고 곧 애도를 표시하고자 하였다. 이날은 마침 잔치가 있는 뒤끝이고, 예조에서는 아직 조회정지(고관이 죽으면 조문의 표시로 조회를 정지함)의 공문이 없었으므로 지신사 안숭선이 다음 날로 미루도록 권유하였다. 게다가 날도 저물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왕은 흰 옷 차림으로 홍례문 밖에 나가 백관을 거느리고 같이 의식을 거행하였다. 유관은 이렇게 학문과 문장이 뛰어 나면서도 성품이 매우 청렴 검소하고 청빈하여 세종대에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글·고혜령 한국고전번역원이사 사진·문화재청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