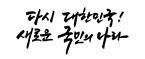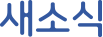- 제목
- 서화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배첩
- 작성일
- 2016-02-02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4237
창덕궁 대조전의 궁중 부벽화 원형 복원
2015년 5월, 우리는 창덕궁의 궁중벽화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다시 만났다. 오랜 세월에 훼손되어 퇴색했던 그림이 원래의 빛으로 생생하게 살아나 내 눈앞에 있던, 그날 그 자리에서 받았던 감동이 기억에 새롭다.
창덕궁은 일제강점기인 1917년 화재로 소실되어 1920년에 재건되었다. 그중 대조전에는 김은호와 이용우 등 당대 최고의 화가들을 동원하여 비단 위에 봉황도와 백학도를 그려 벽화로 붙여, 순종황제와 윤황후의 무병장수와 황실의 위엄을 상징하였다. 그러나 이후 대조전의 주인이 사라지고 궁궐이 비면서 그곳에서 우리의 관심이 멀어지는 세월 동안 찬란하게 빛나던 벽화도 비단이 찢어지고 햇볕에 바래고 먼지가 뒤덮이고 안료가 떨어져 나갔다. 회화가 지니고 있어야 할 원래의 아름다움이 훼손되었다.
그러다 창덕궁 대조전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에 힘입어 벽화가 주목을 받았다. 이에 2013년 벽화를 떼어내어 2년에 걸쳐 원본을 되살리고자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대조전에서 벽화를 해체하면서, 오래되어 유연성이 줄고 산화되고 열화된 구배접지를 먼저 제거한 다음, 그림 위 해묵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냈다. 그리고 찢어진 비단에는 얇은 한지를 뒤쪽에 덧대어 맞물리고, 결손된 비단은 메우고, 떨어진 안료를 2.5%의 묽은 아교를 발라 고정시켰다. 그림을 강화하기 위해 얇은 닥지를 한 겹 한 겹 붙이되, 오리목 열매로 염색한 닥지로 1차, 다시 닥섬유에 호분 10%를 섞은 호분지에 고풀로 2~3차 배접을 하였다.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되살린 창덕궁 대조전 벽화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오래 후손 곁에 머물게 될 것이다.
전통 시대의 배첩과 장인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배첩은 무엇이라 했을까?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이나 「의궤」 등 각종 기록에서는 배첩보다 ‘장황(粧潢,裝潢)’, ‘회장(繪粧, 回粧)’, ‘장배(粧褙)’ 등의 용어가 많이 발견되고, 일제강점기에는 ‘표구(表具)’라는 말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장황은 중국이나 일본의 장식할 ‘장(裝)’보다 꾸밀 ‘장(粧)’을 애용하였고, 어진이나 교명을 제작할 때 ‘상회장(上繪粧)’이나 ‘하회장(下繪粧)’ 등 용어를 사용하여 양국과 차이를 보이는 것도 주목된다. 『의궤』에서 장인을 찾아보면 ‘배첩장(褙貼匠)’,‘장책장(粧冊匠)’, ‘장첩장(粧貼匠, 粧帖匠)’, ‘회장장(繪粧匠, 回粧人)’, ‘장황인(粧潢人)’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그들이 제작한 형식에 따라 족자를 만드는 ‘족자배첩장(簇子背貼匠)’, 병풍을 만드는‘병풍장(屛風匠)’, 교명에 회장을 두르는 ‘교명회장장(敎命繪粧匠)’등으로 세분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이렇듯 배첩은 한지나 비단 위에 쓰거나 그린 서화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실용성과 외형을 강화하고 꾸미는 장식성이 결합시켜 예술성을 높이는 기술이었다.
고서적이나 회화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수명을 늘려주자
조상들이 만든 고서적이나 회화 및 불화 등은 오래되면 낙엽처럼 바스러진다. 여기에 종이나 비단을 붙여 책자·족자·병풍 등의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 아름다움은 물론 실용성을 높여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66년 석가탑에서 발견되어 세계에서 가장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알려진 ‘무구정광다라니경’(국보제126호)을 들 수 있다. 이 경전은 발견된 지 20여 년이 지난 1989년에서야 비로소 두루마리를 해체하고 그 원형을 되살려내면서 그 안의 내용까지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96년 나원리 5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함 안에는 다 헤진 종이편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일일이 해체하고 보존 처리한 결과 이 또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조각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한편, 박물관이나 사찰 및 종갓집 등지에 소장되어 있던 오래된 서책이나 서화 등도 마찬가지이다. 고려 불화의 백미인 ‘수월관음도’, 영조나 철종 등의 국왕을 그린 어진, 조선 시대 왕실행사를 기록한 ‘왕실의궤’, 불교의 여러 존상을 그린 각종 ‘불화’ 등 수많은 고서적이나 고서화가 우리 곁에 있다. 이렇게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화 문화재도 제때 전통적인 배첩 기술과 과학적인 보존처리로 원형대로 보수하면 200~300년, 심지어 400년 이상 더보존할 수 있다.
고서화를 접할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현명하고 훌륭하다는 것을 한층 더 느끼게 된다. 고서화를 되살릴 때 한 장 한 장 물로 씻으면 손상된 부분이 떨어져 나갈 법도 한데 한지는 멀쩡하게 살아난다. 천 년을 간다는 한지답게 부드러우면서도 강하다. 종이의 때가 빠져서 흰빛이 살아나고 먹빛이 선명해진다. 세척해도 되는 종이는 우리 한지밖에 없다. 배첩은 바로 그 한지를 사용하여 고서적이나 회화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글‧장경희(한서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사진‧국립고궁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