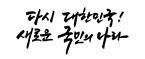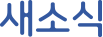- 제목
- 궁중의 먹거리 진상품과 전복
- 작성일
- 2014-02-13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7764
때에 맞춰 진상되는 각 도 특산물
특산물들은 공납(貢納)과 진상(進上)이라는 제도에 의해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 때를 맞추어 올라오고, 궁궐의 식재료를 담당하는 사옹원을 거쳐 각 궁에 전달돼 그것으로 소주방, 수라간, 숙설소에서 궁인들과 숙수(熟手)들에 의해 일상의 수라상과 크고 작은 잔치에 쓰이는 음식을 만든다.
공상(供上)은 왕 및 왕족의 일상생활과 권위 유지에 필요한 여러 물산을 조달, 공급하는 일이다. 공물(貢物)은 토지의 물산을 상납하는 제도로, 백성들이 관청이나 종주국에 세금으로 바치던 특산물을 말한다.
궁궐은 왕이 백성을 통치하는 관공서이기도 하지만, 왕과 그 가족들이 함께 사는 생활공간이기에 진상되는 물량이나 가짓수가 어마할거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공물의 종류로는 그릇·직물·종이·자리류 등의 수공업품, 광산물, 모피류, 목재류 그리고 생선·조개·산짐승·날짐승·과실류 등 식품류, 한약재류, 광물류 등 전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들이 그 대상이 된다. 각 지방마다 백성들이 공물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상인과 아전들이 물품을 대신 납부하고 몇 배에 달하는 대금을 받는 폐단이 심해졌다. 이런 중간 관리들의 부정이 극도로 문란해지자 광해군 원년(1608)에는 모든 세납을 쌀과 베로 대납하는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공선정례』에는 경기·충청·전라·제주·경상·강원·황해·함경의 여덟 지방의 순으로 대전·왕대비전·혜경궁·중궁전·세자궁의 각 전마다 올리는 삭선(朔膳)과 정조·단오·추석·동지·탄일에 올리는 명일물선이 적혀 있다.
각 도별 진상된 식품들은 궁과 가까운 지역인 경기도, 충청도, 황해도 등에서는 생물들을 받을 수 있지만, 먼 곳인 전라도와 함경도, 경상도와 제주에서는 상할 염려가 있기에 건조하거나 염장하여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대개 생선류가 그러하다.
궁중 진상품 중 으뜸, 전복
전복은 바다를 접한 지방인 제주를 비롯하여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와 황해도에서는 자주 진상해야 하는 품목이었다. 제주도의 전복 진상은 매월 잡히는 대로 지속적으로 수군통제사들을 통해 운송해야하니 진상품 중 가장 어려웠던 식품이었을 것이다.『 공선정례』에 기록된 월별 진상 품목을 보면 제주도에서는 2~9월까지 각 전(殿)에 보내진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 말린 전복으로 진상되나 생복은 추운 계절, 충청·황해 등 궁과 가까운 지역에서 봉송되었다. 궁중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전복이 자주 등장하니 가장 귀한 재료며 최고의 식재료로 쓰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전복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그 이유는 궁중 진상품으로는 해물 중 가장 맛있으면서도 채취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정해진 수량을 보내는 것도 백성들에겐 매우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태종 17년(1417)에는 공을 세운 신하에게 술과 함께 안주로 말린 전복을 하사하였고, 성종 14년(1483)에는 중국에 보내는 명절인사로 마른 생선과 함께 전복, 추복 등의 진헌품을 보냈다. 성종, 중종, 선조, 광해군, 숙종 때는 전복은 바다 깊이 들어가 채취하기가 너무 힘들었기에 물량을 대기가 힘들어 전복 진상에 무리가 있으니 감해달라는 청원이 계속 올라오며 토산물의 진상폐단을 거론하고 있다. 연산군은 일본산 전복이 있다 하니 사서 바치고, 그 밖에 특이하고 맛있는 것을 널리 구해 바치라고 하명하기도 했다.
『진찬의궤』에 나타난 궁중음식 중 대부분의 탕, 찜에는 다른 고기류와 함께 전복이 꼭 들어가며 전복을 주재료로 하는 음식에는 추복탕, 전복초, 전복느름적, 생복화양적, 생복찜, 전복숙, 생복회, 전복쌈 등이 있다.
생복찜은 재료로 추측하면 생전복에 쇠고기 안심, 표고가 들어가고 간장 간을 해서 심심하게 끓인 후 달걀지단, 황화채, 목이 버섯을 고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복 숙은 마른 전복을 불리고 닭고기와 함께 간장, 굴, 참기름을 넣어 무르게 익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복초는 마른 전복을 불려 얇게 떠서 쇠고기 안심과 함께 진장과 꿀을 넣어 가무스름하고 윤기 나게 조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생복화양적은 큰 전복에 우둔, 양, 곤자손이, 등골, 돼지다리와 도라지, 표고 등을 양념하여 볶아 골고루 꼬치에 끼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생복회는 다른 재료 없이 생복과 잣만 있어 싱싱할 때 잣가루만 뿌려 먹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물론 전복이 맛있고 귀해서만 궁중에 애용하는 식품으로 쓰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개류는 피로해진 신경을 회복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복은 눈의 피로 회복에 매우 좋다.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타 식품에 비해 월등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인, 철, 요오드, 칼슘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 A, B1, B2 등도 풍부하여 자양강장식품으로 여긴다. 햇볕에 말린 전복포는 강장식품이었다니, 궁궐에서 당연히 왕족들의 건강을 위한 일급 식품으로 여겼을 것이다.
지금도 전복죽을 기운 없을 때, 산후조리에, 병후회복에 잘 쑤어 먹는 이유가 기운이 나며, 피로회복에 좋으며,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효능때문이다.
글·사진 한복려(중요무형문화재 조선왕조궁중음식 기능 보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