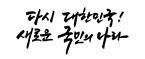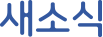- 제목
- 철원鐵原 한반도 역사의 중심에 서다
- 작성일
- 2014-12-05
- 작성자
- 문화재청
- 조회수
- 6644
강원도 철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비무장지대, 철의 삼각지대, 그리고 6.25전쟁 때 1만 8천여 젊은 이들의 넋이 사라진 백마고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또 최전방부대 제대군 인들의 젊은 날이 담긴 혹독한 군대생활의 추억도 잊을 수 없다. 그 뿐인가. 도로 바로 옆 수풀이 우거진 지역에 악 마의 혓바닥처럼 날름대는 미확인 지뢰표시는 어떤가. 공산치하의 산물 이라는 노동당사(등록문화재 제22호)와, 남북한 공법이 조화를 이뤘다는 승일교(등록문화재 제26호), 철원-금강산을 이어주던 끊어진 금강산 전기철도(금강산 전기철도 교량, 등록문화재 제112호), 여기에 포탄세례에 녹슨 철골이 훤 히 드러난 암정교와 만국기가 휘날리듯 아슬아슬 걸려있는 출렁다리 등 온통 전쟁·분단·냉전의 산물 뿐인 것 같다.
하지만 평화전망대에 올라보면 비무장지대와 철책으로 에워싸인 첩첩산중의 고지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한 번에 깨진다. 춥고 어둡고 답답하고 을씨년스러울 것 같다는 이미지 역시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진다.
멀리 북쪽을 바라보면 둑처럼 높은 평강고원이 병풍처럼 주변을 두르고, 그 밑으로 거대한 평야가 펼쳐진다. 철 원 흥원리와 월정리, 평강 가곡리를 아우르는 평야의 이름은 풍천원 벌판이다. 철원 평야의 전체면적은 서울 면적(605㎢)보다 넓은 650㎢(2억 평)에 이르는데, 해마다 철새들이 찾아오는 낙원이 가운데 있다(철원 철새 도래지, 천연기념물 제245호).
평화전망대 왼편으로는 도성의 흔적이 이어진다. 905년 궁예가 세운 태봉국 도성의 흔적이다. 저 풍천원 벌판은 ‘온 세상 사람들이 어울리는 평등한 세상’을 꿈꾼 궁예의 야망이 깃든 곳이다. 외성 12.5㎞, 내성 7.7㎞에 이르는 도성은 지금 군사분계선을 딱 반으로 가르고 있다. 여기에 서울-원산을 잇는 경원선 철도가 동과 서를 자른다. 그런 의미에서 태봉국 도성은 남북 분단의 상징유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 남북한의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 공동으로 조사하는 날이 온다면, 이 유적은 화해와 평화의 유산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독존신이 된 궁예
궁예는 신라의 왕자(헌안왕 또는 경문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곧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는 대동방국의 기 치를 내세우며 태봉국을 세웠고, 철원 땅에 두 번이나 도읍을 정했다(896년 동송, 905년 풍천원). 그러나 궁예는 918년 보수 호족들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고려사』는 궁예의 최후를 전하면서 “궁예가 굶주림에 지쳐 보리이삭을 훔쳐 먹다가 부양(평강) 주민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다”고 전했다. 그런 궁예의 흥망을 옛 문인들은 한결 같이 애수(哀愁)에 가득 찬 시구로 노래했다 . 예컨대 성현(1439~1504)은 “궁예왕이 앞 수레의 엎어짐을 거울삼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속동문선』 ‘차 철원동헌운’). 궁예왕이 한고조 유방에게 멸망당한 진나라의 전철을 밟았다는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에는 다음 과 같은 시가 남아있다.
“나라 부서진 산하가 한 고을이 되었어라(國破山河作一州). 태봉의 남긴 자취가 사람을 시름케 하네(泰封遺跡使 人愁). 지금은 미록(고라니와 사슴)이 와서 노니는 땅이 되었다(至今미鹿來遊地). 즐겨 놀기만 일삼은 궁예왕이 가 소롭구나(可笑弓王事逸遊).”
모두 민심을 잃은 궁예왕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철원·평강 주민들은 예부터 비운의 궁예왕을 독존신(獨存神)으로 모시고 있다.
궁예가 추종세력과 함께 보개산성(포천 관인), 명성산성(철원 갈말), 운악산성(포천 화현) 등에서 10~15년간 더 치열한 항전을 벌였다는 것이다. 최남선이 채록한 『풍악기유』는 “궁예왕이 재기를 노리다 좌절되자 심연에 몸을 던졌는데 우뚝 선채로 운명했다”고 전했다. 이곳 사람들은 예부터 궁예왕을 폭군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한반도의 배꼽이자 문명의 젖줄
철원평야 한 가운데 버티고 있는 북관정터는 송강 정철이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지었다는 유서 깊은 곳이다. 멀리 북쪽을 바라보면 군사분계선 너머에 낙타고지(432.3m)와 장암산(1052m)이 어렴풋 보인다. 그런데 그 바로 왼편 에 아른거리는 야트막한 산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산이 바로 오리산(鴨山)이다. 해발 453m에 불과해 얼핏 야산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산이 광활한 철원평야를 낳았고, 고인류를 탄생시킨 ‘한반도의 배꼽산’이다. 무슨 얘기인가. 까마득한 날에, 그러니까 제4기 홍적세(200만 년 전~1만 년 전) 사이에 철원에서 5㎞ 떨어진 곳(오리산)에서 용암이 분출됐다. 분출은 최소한 11번 계속됐다.
용암분출은 백두산·한라산과 같은 중심폭발이 아니라, 꾸역꾸역 흘러나오는 열하분출이었다. 서서히 흐르 는 용암은 대지를 메웠고, 추가령구조대의 낮은 골짜기를 따라 흘러갔다. 철원과 평강, 이천, 김화, 회양 등 650㎢ 가 용암의 바다로 변한다. 용암이 식자 그곳은 끝없이 펼쳐지는 용암대지가 되었다. 진원지 오리산 인근지역의 분출 이 많은 것은 당연지사였다. 이것이 철원(해발 220m)보다 높은 평강고원(330m)이 생긴 이유이다.
한편 액체인 용암이 식어 현무암으로 변하자 수축작용이 일어났다. 그러자 흐르는 용암과 맞닿았던 원래의 지형 과 수축해버린 현무암 대지와는 틈이 생겼다. 빙하기를 지나 간빙기에 이르자 높은 평강·철원에서 녹은 빙하 는 그 틈을 찾아 낮은 곳으로 흘러갔는데 이것이 바로 한탄강이다. 도로가 마땅치 않던 강물은 문명의 젖줄이 됐다.
한탄강 유역의 두터운 용암대지엔 고인류가 터전을 잡고 살았다. 급기야 연천 전곡리에서 구석기 시대 ‘맥가이 버 칼’로 일컬어지는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쓰는 고인류(27만~30만 년 전)가탄생했다. 그러고 보니 오리산과 철원은 한반도 문명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용암이 식어 만들어진 현무암은 또 한 번 조화를 부린다. 원래 취약한 현무암은 물에 의해 침식될 때 덩어리째 떨어져 나간다. 침식원인이 있는 취약한 곳부터 빠르게 무너지는데 특히 수직절리현상이 있는 곳은 직각에 가까운 절벽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기둥모양으로 켜켜이 떨어진 모습이 장관을 이루는데 이른바 주상절리라 한다. 동송읍 장흥리 송대소와, 신라 진평왕과 고려 충숙왕이 노닐었다는 고석정 일대 수직단애, 그리고 대교천 주상절리가 탄생 한 것이다.
이밖에도 가마솥 같이 생긴 삼부연 폭포와, 병자호란 승첩으로 유명한 유림과 홍명구의 혼이 담긴 충렬사, 그리 고 영원한 안식처에 이르렀다는 멋들어진 이름을 갖고 있는 도피안사가 길손의 발길을 붙잡는다.
그러고 보면 철원은 왠지 어머니 품 같다는 생각이 든다. 드넓은 철원평야 사이로 뚫린 도로를 달리면 세상의 모 든 찌꺼기, 모든 시름, 모든 응어리가 사라지는 듯하다. 어머니의 자궁 같은 땅과, 탯줄 같은 강물이 있기 때문이려 니….
글 이기환(경향신문 사회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