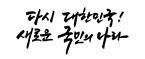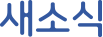문화재 기고
- 제목
- 문화재의 뒤안길(51)-조선시대 명기(明器)(서울경제, '20.8.3)
- 작성자
- 이명옥
- 게재일
- 2020-08-03
- 주관부서
- 대변인실
- 조회수
- 1842
[문화재의 뒤안길] 죽은이 내세 기리며 함께 묻은 명기(明器)
글 /이명옥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판관공 윤사신(判官公 尹思愼)의 부부 무덤에서 출토된 1585년께 제작된 백자 명기 일습. /사진출처=국립중앙박물관
[서울경제] 조선 시대 무덤을 발굴하면 매우 작은 형태의 기물들이 발견되고는 한다. 사람이 죽은 후에도 현세와 같은 생활이 계속된다고 믿는 내세적 관념이 적용돼 무덤에 함께 묻었던 기물, 명기(明器)라 불리는 유물이다.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의 무덤에 강제로 묻는 고대의 순장(旬葬)을 대체하고자 우리나라 삼국시대 무덤에는 토우, 고려 때는 각종 청자 용기 등을 묻었다.
고려 시대 무덤에서 발견되는 청자가 당시 실제로 사용하던 것이었다면, 조선 시대에는 실제 사용하던 기물들로 구성은 하되 크기를 매우 작게 축소시켜 새로 제작한 것들이다.
조선 시대에 명기는 성리학의 도입과 함께 유교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상장례 의식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왕실에서 사용한 명기는 ‘세종실록’ 중 ‘오례의’편의 흉례(凶禮) 명기조(明器條)에 기물의 종류, 재질과 함께 그림까지 그려져 있어 잘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명기가 일정한 규범에 따라 만들어지고 관리됐음을 유추할 수 있다. 명기에는 생활용기·제기·악기·무기 등이 있고, 간혹 여성과 남성의 인물상이나 말 모양의 동물상도 있다. 재질은 도자기·와기·나무·청동 등이다.
언뜻 보면 마치 소꿉놀이에 쓰일 법할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별로 품을 들이지 않고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기물을 똑같이 재현했기에 극도로 정교할 뿐 아니라 상당히 공을 들여 도자기를 굽기도 했다. 무엇보다 명기는 왕실이나 신분 높은 일부 지배계층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신분의 등급에 따라 무덤에 넣을 수 있는 수량도 달라진다. 15세기에 편찬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4품 이상의 사대부는 30벌, 5품 이하는 20벌, 서인(庶人)은 15벌로 규정했다.
명기는 시대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조상에게 ‘예(禮)’를 다함에 있어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를 알게 해준다.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