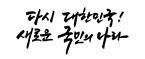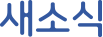- 제목
- 조선백자의 역사와 혼이 담긴 경기도 광주
- 작성일
- 2014-02-13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10388
우리의 도자기, 청자에서 분청으로
경기도 광주는 오늘날 조선백자(朝鮮白磁)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는 조선 전기 사옹원(司饔院)의 분원(分院)이 설치되어 질 좋은 백자를 본격 생산한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우리 땅의 도자 역사는 조선백자 이전에도 한참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으로부터 청자제작기술이 전해진 이래 우리나라에서 처음 자기(磁器)를 만든 지는 1,000년을 넘겨 흘렀다. 우리 도자 하면 흔히 청자(靑磁)와 분청사기(粉靑沙器), 백자(白磁)를 떠올리는데, 특히 고려청자는 중국의 청자와 비교하여 비색(翡色)으로, 당시 중국에서도 천하제일로 인정했다.
이러한 청자가 서해바다에서 인양되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고려시대 청자 생산을 대표했던 강진과 부안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곳에서 만들어진 청자는 대부분 배로 서해안을 따라 수도 개경의 수요를 감당했다.
고려 말에 와서 이들 지역은 해안에서 가까운 지리적 위치때문에 왜구의 침입이 잦았고 또한 혼란한 국가 정세로 인해 더 이상 안정적인 환경에서 청자를 제작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청자 장인들은 내륙 각지로 흩어져 새로운 양상의 도자기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상감청자의 전통을 잇는 분청사기이다. 분청사기는 그릇 표면에 분장을 하는 특징 때문에 미술사학자 고유섭 선생이 ‘분장사기’로 처음 이름 붙인 것이 분청사기가 되었다. 상감, 인화분청사기는 한때 조선왕실과 관청의 공납용으로도 제작되었지만 조화·박지, 덤벙, 귀얄과 같은 기법에서 보다 서민적이고 소박함을 잘 보여준다.
우수한 백자 생산이 가능한 양질의 땅
하지만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내세워 건국한 조선은 중국 명나라의 백자를 닮은 견고하고 깨끗한 백자를 선호하였다. 왕실과 궁궐에 필요한 음식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청인 사옹원은 왕실과 궁중행사, 사신 영접은 물론 관청과 궐내에서 폭넓게 사용할 백자를 필요로 했다. 이를 전담하기 위해 사옹원은 분원을 두고 그릇의 제작뿐만이 아니라 형태, 품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담당하게 했다.
이는 왕실에서 직접 백자 제작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그 적합지로 경기도 광주가 선택되었다. 당시 광주에서 생산된 백자는 중국에 조공될 정도로 질이 우수했고, 또한 광주는 지리적으로 한양과 가까워 한강을 통한 백자 운송이 용이하였다. 또한 유약의 원료인 수을토와 땔감이 풍부하여 연료와 원료의 수급에도 편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처음 사옹원 분원이 경기도 광주에 설치된 것은 1467년 전후이며, 이후 백자의 품질은 고르고 좋아져 양질의 백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분원은 사옹원에서 파견된 낭청에 의해 관리·감독되었으며 봄, 가을로 나눠 대략 4개월씩 1년에 총 2회 제작하여 배에 실어 한양으로 보냈다. 이렇게 한양으로 들어온 그릇들은 사옹원 직장에 의해서 검사와 공정을 마친 뒤 진상되었다.
당시의 가마는 가스나 전기를 사용하는 오늘날의 가마와는 달리 땔감을 사용했는데 불을 조종하고 온도를 맞추기가 힘들었다. 뿐만 아니라 가마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요인으로 온전한 백자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다. 조선 중기 청화 지석을 얻으려고 분원을 방문했던 문인 이하곤은 그의 문집『두타초』에 ‘열에 아홉은 불량이 난다’고 하였는데, 당시 분원 가마터에는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어 파기한 편들이 가마 주변에 많이 쌓여있었다.
진상용 백자 제작의 중심, 광주 분원
분원의 중요한 입지조건 중 하나는 땔나무를 얼마나 원활하게 조달하느냐인데 이를 위해 분원은 수목이 무성한 곳을 찾아 대략 10년을 주기로 이동했다. 15~16세기 관요는 광주를 남북으로 흐르는 경안천의 큰 줄기를 따라 조성되었지만, 17~18세기에는 이전과는 달리 경안천의 소하천을 따라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다. 18세기 들어 땔감인 나무가 무성한 곳을 찾아 잦은 이동을 했던 분원은 우천(牛川)을 지나던 배와 화전민들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나무를 구입할 수 있어서 더 이상 옮길 필요 없이 한 지역에 정착하였다.
1752년 광주 남종면 금사리에서 분원리로 옮겨 마지막으로 130여 년간 운영되었는데, 오늘날 남종면 분원리라는 마을 이름은 분원이 이곳에 오랫동안 정착했던 것에서 유래한다. 분원리로 이전한 이후 국가의 경제적 안정과 번영 위에서 조선백자는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이 무렵 왕실에서 사용하는 품질 좋은 그릇의 제작이 많아졌으며 연행과 무역의 활성화로 청(靑)과 교류가 빈번해져 중국 도자의 영향을 받은 백자들이 등장한다. 그렇지만 진상용 백자 제작의 중심은 여전히 광주 분원이었다.
분원리에서 다시 꽃피운 백자
분원리에서 처음 만들던 백자는 우윳빛 유색에 간소한 청화문양, 각이 진 형태 등 이전 금사리 관요 백자의 여운이 남아 있었지만, 차츰 분원리만의 특징을 보이며 변화하였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청백색의 백자가 제작되어 분원리만의 특징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정조 때 청화백자 제작을 금지하자 양각백자가 제작되기도 하였으며, 회화풍과 도안적인 청화 문양 외에도 안료를 흩뿌려 채색하는 채색자기들이 등장하였다.
또한 중국 다채자기가 유입되면서 조선의 청화백자에도 유면 아래에 장식된 청화안료를 중심으로 동화, 철화 등 다양한 안료가 사용되었고 음각, 양각, 투각기법을 혼용하여 다양한 백자를 제작하였다. 분원리 후반에는 청화백자가 점차 짙은 발색을 띠며 문양이 더욱 복잡해지거나 도식화되어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문양을 뚫은 종이를 대고 같은 문양을 찍어내는 공판화(孔版畵)기법도 등장하였다.
분원과 함께 저무는 조선백자의 역사
조선 중기 큰 전란(戰亂)을 겪고 주춤했던 분원은 18세기 다시 한 번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 세도정치로 인한 왕권의 약화와 관리들의 부패가 점차 심해져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졌다. 더욱이 일본의 왜사기와 서양 자기의 틈새 속에서 우리 백자가 경쟁력을 잃어감에 따라 민간자본이 유입되었다. 한때 생산량이 늘어나고 폭넓은 수요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발전도 시도하였지만, 결국 1883년 12인의 상인물주에게 분원의 경영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민영화 이후 한동안 분원리 가마의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전국에서 상인이 몰려와 성황을 이루기도 했지만, 20세기로 접어들면서 큰 변혁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저물었다.
현대에 재창조되는 조선백자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도자 전통은 단절되었지만 조선백자를 수집하던 일본인이 있었는데, 야나기무네요시(柳宗悅),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 형제가 그들이다. 특히 아사카와 다쿠미 형제는 조선 전역을 누비며 도자기를 수집하고 가마터를 조사하여『 조선도자명고』를 남겼다.
광복 후에는 여러 차례에 걸친 분원유적 조사를 통해 현재 340여 개소의 가마터가 확인되었고, 일부 유적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1960년대 들어 광주 도마리 백자가 마터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조선백자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조사·연구는 국토개발이 본격화된 80년대 이후이며, 번천리, 우산리, 선동리, 분원리, 송정동, 신대리, 무갑리 등의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조선백자의 예술성과 세련미, 소박함과 절제미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도자사적 시각에서 본다면 조선시대 500년 도자역사는 곧 백자이며, 또한 분원이자 광주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백자는 오늘날에도 전통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작가들에 의해 공예, 예술적 측면에서 조선백자의 격조와 우아함을 겸비한 검소함으로 재창조되고 있다.
글 강명호(경기도자박물관 학예사) 사진 경기도자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삼성미술관 리움
- 다음글
- 겨울, 남한산성에서의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