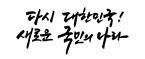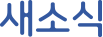- 제목
- 공중전화의 종말이 전하는 진짜 메시지
- 작성일
- 2014-02-13
- 작성자
- 문화재청
- 조회수
- 10206
옥외 무인전화 부스의 등장과 줄서기
191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땅에서 ‘공중전화’는 ‘자동전화’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1902년 3월 20일 통신업무를 관장하던 통신원이 한성과 인천 사이에 설치한 전화소가 공중전화의 첫 등장이었다. 하지만 무인부스에 혼자 들어가 동전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공중전화가 아니었다. 전화소 관리인인 장리가 통화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싸우거나 도의에 어긋난 농담을 할 때는 통화를 중단시킬 수도 있었다.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무인 옥외 공중전화의 등장은 1960년대에나 가능했다.
1927년이 되면서 식민지 조선의 ‘자동전화’는 ‘공중전화’로 불리기 시작한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중전화의 수요는 해마다 늘어났지만, 일제는 공중전화 설치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했다. 1937년 이전까지도 전국 공중전화소 수는 100개를 넘지 못했고, 어쩌다 하나씩 생겨나는 신규 공중 전화소는 파출소 부근에 세워졌다. 전시지원체제가 강화되는 1941년에는 시국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화가설 및 전보 업무가 폐지됐다.
옥외 무인 공중전화가 최초로 설치된 것은 1962년 9월 20일의 일이었다. 장소는 서울 시청 앞, 화신백화점 앞 등 10개소였다. 개인관리인 없이 체신부가 직접 운영하는 무인 전화부스는 시민들이 5원짜리 동전만 넣으면 통화할 수 있었다. 이듬해까지 무인 공중전화는 40개소로 늘어났지만, 송수화기 절도와 가짜 주화 사용이 극성이었다. 참고로 이공중전화는 시내 통화만 가능했다.
1970년대에 이르면 사거래 전화 값이 집 한 채 값이 될 정도로 ‘전화전쟁’은 극에 달한다. 집 전화보다 공중전화 요금이 쌌기 때문에 전화가 있는 사람들조차 공중전화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훗날 시티폰처럼 어처구니없는 제품이 대중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까닭도 수 십 년을 되풀이해온 공중전화 줄서기에 대한 지긋지긋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보 통신 시장은 앞선 80년 동안의 변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다. 198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맞춰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족했고, 매년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돼 100만 회선의 전화가 증설됐다. 1982년에는 시내·외 겸용 공중전화가 보급됐고, 1986년에는 아시안게임과 함께 카드사용 전화기가 보급됐다. 그리하여 1987년에 1가구 1전화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응답하라 1994>와 시티폰
1990년대는 공중전화의 최대 전성기이자 종말 전야였다. 1993년 우등고속버스에도 공중전화가 놓였고, 1995년 설악산에 태양열 공중전화가 설치됐다. 통화 서비스도 다양해졌다. 공중전화의 가장 우애로운 미디어는 ‘삐삐(무선 호출기)’였다. 불야성을 이룬 주말 번화가에는 삐삐에 찍힌 전화번호를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공중전화 부스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1990년대 일상의 풍경이다. 쇼핑 도중 삐삐를 받고 우왕좌왕하지 않게끔 메트로 미도파 백화점에서는 삐삐방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삐삐와 함께 전화카드도 생활필수품이었다. 그런데 전화카드가 처음부터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대도시 터미널 앞 광장에는 으레 10대 묶음의 공중전화가 있는데, 그중 7대가 카드식이고 나머지 3대가 동전식이었다. 동전식 전화부스 앞에는 늘 줄이 길었다. 전화 한 통이면 될 일에 3,000원, 5,000원짜리 카드를 사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전화카드 수집 인구도 이 시기 꾸준히 늘어났다. 1992년에는 서울 아시안게임 이후 1992년까지 발행된 국내·외 공중전화카드 2,000여 종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카드전시회가 열렸다. 이런 전시회는 90년대 말까지 해마다 각지에서 열렸다. 1992년 배우 고(故) 최진실씨가 자신의 사진과 자필서명을 넣어 발행한 2,000원짜리 전화카드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20여만 원 이상 가격에 거래됐다. 뒤이어 1995년에는 연예인 전화카드 PR 붐이 일었다.
불꽃처럼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몰락해버린 시티폰은 공중전화와 전화카드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弔鐘)이었다. IMF 경제위기가 닥쳤던 1997년의 일이다. 시티폰은 휴대전화라기보다는 움직이는 공중전화였다. 전화를 걸 때마다 공중전화 가까이 가야만 했던 이상한 전화기. 그런 사용법을 불편해하기보다는 근사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의 상상력은 참 소박했다.
하지만 서민들의 오래된 꿈은 미디어환경의 빠른 변화에 압도돼 농담거리가 되고 말았다. 얼마 전 방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전 재산을 시티폰에 투자했다가 날린 가족의 일화가 웃기기보다는 슬프고 안쓰러웠던 까닭도 이 때문이다.
공중전화의 종말이 전하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 가난한 삶의 리듬을 무의미한 것으로 압도하는 자본과 기술의 폭주를 향한 경고가 아닐까. 공중전화 앞에서 줄을 서는 기다림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글 임태훈(미디어연구가), 사진 KT정보통신박물관, 연합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