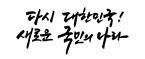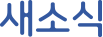- 제목
- 내 어찌 잊으리오, 꿈에 그리던 그 섬
- 작성일
- 2015-01-09
- 작성자
- 문화재청
- 조회수
- 3949
험한 뱃길 달려 마주한 아득한 섬
겨울철 독도해상의 날씨는 바로 다음 날도 가늠하기 힘들만큼 변화 무쌍하다. 울릉도와 독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중 그나마 높은 파도에도 잘 다닌다는 여객선도 겨울에는 툭하면 항구에 발이 묶이기 일쑤다. 다행히 결항은 아니었지만 독도로 향하는 뱃길은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다. 돌섬 하나 배 한척 보이지 않는 고독한 여정, 겨울 파도가 내는 우레같은 소리만이 망망대해를 울릴 뿐이다.
“앞으로 10분 뒤면 독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입도 여부가 결정되오니 잠시 선내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다. 짧은 시간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고, 객실 안은 적막 속에 긴장이 감돌았다. 그리고 잠시 뒤 기다렸던 소식이들렸다. “축하합니다. 하늘이입도를 허락했습니다.” 순간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동해의 거친 물살 가르고 다가선 국토 최동단. 망망한 바다에 외따로 솟아 있는 바위섬 주위를 갈매기들이 바쁘게 맴돌고 있었다.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독도였지만 막상 눈앞에 마주하자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조상이 민족의 자존을 걸고 지켜온 섬의 지난한 역사 때문일 것이다.
신라 지증왕 13년(512), 왕명을 받은 이사부가 나무 사자를 이용해 우산국을 정복하면서 우리 역사에 등장한 독도는 이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등으로 불리다 고종 18년(1881)부터 ‘독도獨島’ 로 불리게 됐 다. 독도는 이름처럼 ‘홀로 있는 섬’ 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독도만큼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받는 섬도 없을 것이다.
태고의 자연, 천혜의 풍경
독도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큰 섬과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도 해협에 들어선 배가 맨 먼저 만나는 곳은 서도 서쪽 사면. 해식동굴을 지나 코끼리바위 옆을 지난다. 코끼리바위는 바다 쪽 돌출 아치가 둥그스름하게 미끄러져 내려와 마치 코끼리가 물을 마시는 형상이다. 바위 겉면의 결도 코끼리 거죽과 흡사해 누가 봐도 코끼리를 떠올리게 된다. 긴 세월 물결에 씻겨 구멍 뚫린 바위는 진청색 바닷물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풍광을 그려내고 있었다.
드디어 배가 선착장에 당도했다. 꼭 한번 가보리라 생각하면서도 늘 마음만 맴돌았던 그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가볍지 않은 전율이 온몸에 퍼졌다. 우리 국토의 최동단을 지키는 독도경비대원들이 늠름한 경례로 일행을 맞이했다. 선착장 초입에는 ‘독도 이사부길 1-69’ 라는 주소표지판이 서있었다. 독도에도 새로운 주소가 생긴 것. 우리가 내린 동도는 ‘독도 이사부길’, 서도는 ‘독도 안용복 길’, 그리고 바위섬들에도 번지가 부여돼있다.
'정말 독도에 왔구나’ 그제서야 실감이 났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텔레비전에서나 봤던 독도의 실물이 눈앞에 있었다. 눈부신 햇살, 깎아지른 절벽, 그 절벽에 부딪쳐 하얀 거품을 일으키는 파도…, 그저 아름다웠다.
독도는 460만 년 전 2천 여 미터 해저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어진 화산섬이다. 하지만 제주도, 울릉도 등 다른 화산섬과는 달리 분화구 같은 화산체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오랜 세월에 걸친 파도의 침식에 의해 화산체의 원형이 사라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산봉 허리를 두르고 있는 선명한 단층과 거대한 포탄 자국처럼 움푹 페인 풍화혈들이 태고의 성스러운 기운을 전해주고 있었다.
동도선착장에서 해안가를 바라보면 이름도 모양도 가지각색인 바위들이 펼쳐져있다. 숫돌바위는 비석을 포개놓은 듯 주상절리가 수십 겹 쌓여 산처럼 삐죽 솟아 있는 모양이고, 부채를 펼친 모양의 부채바위, 부채바위를 조금 지나 나지막하게 해수면에 붙어있는 해녀바위도 멀리서나마 보인다. 해녀바위는 과거에는 해녀들이 휴식을 취했던 장소였고, 한 때는 독도경비대원들을 위해 선착 장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지금도 콘크리트 선착장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 옆으로는 춧발바위가 있다. 울릉도 어민들은 바다의 갑甲, 곶串과 같이 튀어나온 부분을 ‘춧발’ 이라고 불렀다.
일반인의 관람이 허용되는 구역은 동도뿐이지만, 동도선착장에서 서도쪽을 바라보면 독도의 최고봉인 대한봉이 조망되고, 그 능선을 따라 시선을 옮기면 독도의 상징인 촛대바위, 장군바위, 삼형 제굴바위가 병풍처럼 드리워져있어 아쉬움을 달래준다.
찬란한 광채 속의 작별
이렇듯 독도는 섬 자체가 하나의 수석이다. 이 웅장한 수석은 햇빛의 이동을 따라 시시때때로 모습을 바꾸고, 바다의 기상에 따라 얼굴을 달리한다. 적어도 하루 24시간은 머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허락된 시간이 거의 다해가고 있었다.
선착장으로 발걸음을 돌리는데, ‘동쪽 땅 끝’ 이라고 새긴 푯말이 눈에 들어왔다. ‘땅끝’ 이라는 그 단어가 눈에 밟혔다.
아쉬움을 누르며 무거운 걸음으로 배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다. 짙푸른 바다 위에는 은빛 비늘이 일렁였고, 갈매기들은 소리내 울며 떠나는 배주위를 맴돌았다. 오래도록 그려왔던 섬, 꿈에라도 잊히지 않을 기억들을 아로새기며 멀어져가는 독도를 향해 작별을 고했다.
글 성혜경 사진 김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