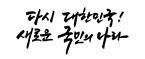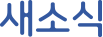문화재청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19일 까지 우리나라의 국보, 보물을 주제로 한 2008년 문화유산 답사기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재 사랑>에서는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을 4회에 걸쳐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수상작품들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연곡사 일주문에 서서
지리산智異山 연곡사燕谷寺 산문에 다다랐다. 시인은 산문에 기대어 누이를 생각했겠지만, 역사학도는 산문을 바라보며 역사의 흐름을 가늠해볼 뿐이다. 수차례 전란으로 스러졌다가 중건된 연곡사. 그 일주문 두 기둥이 ‘지금 여기’, 꼿꼿이 서 있었다. 그 꼿꼿함을 향한 의지로, 주련柱聯의 글씨는 힘 있고 다부졌다.
歷千劫而不古 천겁이 지나도 예스럽지 않으며 / 亘萬劫以長今 만세를 뻗어가도 지금과 같네.
임진왜란에서 6·25전쟁에 이르기까지 매번 잿더미가 되며 한국사의 수많은 고비를 함께 넘었던 연곡사. 그러나 불에 스러진 시기는 한낱 찰나에 지나지 않다고, 몇 천겁이 지나도록 이 자리에 우뚝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일주문의 기둥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절이 산에 있듯이. 산에 절이 있듯이, 내내 이렇게 서 있을 것이라고.
세월을 아로새긴 현각선사탑비
일주문을 지나 소담한 돌계단을 밟고 올라서니, 계단에서 다소 비껴난 뜰에 탑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생뚱맞은 3중 기단에다, 큼직한 기단에 비해 작은 몸돌은 자못 왜소해 보였다. 지붕돌 모서리부분이 바스러진 것도 그렇고 간간이 거무튀튀한 부분까지 한때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듯해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길은 다소 가팔랐다. 현각선사탑비에 다다르자 보물 152호로 지정된 이 탑비는 비신碑身이 실종된 채 귀부와 이수만 남아있었다. 비문碑文은 당대 기록인 만큼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한다. 신기한 것은, 비신의 실종에도 탑비의 주인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이수 가운데 평평한 부분에 희미하게 남은 ‘현각왕사비명玄覺王師碑銘’이 그 주인을 말해주었던 것이다. 역사의 흔적을 지우기란 이렇듯 쉽지 않은가보다.
극치 중의 극치의 美, 연곡사 부도
 |
| |
다시 산길을 올라 어느덧 서부도에 도착했다. 보물 제154호로 지정된 서부도는 팔각원당형으로 전체적인 조화가 잘 맞아 굉장히 아름다웠다. 솟아오른 귀꽃하며 구슬무늬 장식, 중대석의 앙련·복련까지 화려하기 그지 없었다. 게다가 부도 뒤편의, 울타리도 없이 낙엽에 묻혀가는 작은 석종형부도 두 기와 대조되어 더더욱 부각되어 보였다. 그러나 북부도를 보자마자 그 안내판에 ‘심히 동의’하게 되었으니, 북부도의 화려함은 그야말로 ‘극치極値’였다.
국보 제54호인 연곡사 북부도. 서부도의 귀꽃 장식을 ‘화려’라 생각했던 자신이 무색할 정도였다. 지붕돌은 겹처마 끝의 부연附椽은 물론 암·수막새(기와) 무늬까지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하대석의 복련은 연꽃의 결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다 모서리마다 귀꽃이 장식되어 있어 정교함을 더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가릉빈가(극락조)’라는 전설상의 새였다. 머리·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이고, 하반신 및 날개·꼬리는 새의 모양을 띠는데, 그 날개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경쾌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목이 다 날아가 있었다는 게 좀 아쉽지만 말이다. 안내자께서는 이런 현상이 ‘기자신앙祈子信仰’의 일종이 아닐까 추측된다며 수많은 마애불들의 코가 닳아진 것을 그 예로 들었다.
이러한 북부도의 아름다움도 동부도만 못했다. 굳이 표현하자면 ‘극치極値’의 극치였다고 할까. 조각 수법은 북부도와 비슷했지만, 형태의 완벽성이나 세밀함에 있어 동부도는 단연 으뜸이었다. ‘안쏠림’까지 고려해 하나하나 새긴 기둥하며, 한옥기법 그대로 빈틈없이 조각한 지붕돌 및 몸돌, 안상眼象의 주악천녀와 주위 배경의 섬세함, 깔끔함이 돋보이는 몰딩 처리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었다.
왜 동부도부터 올라가지 않고 서부도부터로 코스를 잡았는지 짐작이 갔다. 답은 ‘역치’였다. 극한의 아름다움을 먼저 맛보고 나면, 다른 아름다움은 눈에 차지 않을 것이었다. 정말이지 이 순서로 부도를 본 건 행운이었다. 깔밋한 서부도의 아름다움부터, 동부도의 세밀한 아름다움까지, 각각의 문화재에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감흥을 얻을 수 있었으니.
본연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문화재 답사
동부도 앞 비석도 아까 본 현각선사탑비처럼 비신이 없이 귀부와 이수만 남아 있었다. 비슷한 듯 다른 듯 그저 말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문득 안내자는 “솔직히 무덤 주인조차 알지 못하는 곳에 와 ‘이 무덤 예쁘네’라고 하는 건 좀 볼썽사납지요.”라고 했다. 물론 그 역사의식의 부재로 인해 문화재가 본연의 의미로 읽히지 못하고 변질될 수 있다. 그도 아마 이 점을 우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눈도 때로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역사적’이라는 잣대아래, 잘려나가지는 여백이 얼마나 많은가. 논증된 사실만으로 가득한 역사는 너무도 숨 막히다. 기본적으로 역사가 사람의 삶, 그 삶의 궤적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는 본능을 도외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었다.
돌아오던 길, 답사에서의 느낌표들을 되짚어보았다. 하루를 무료한 휴식으로 채우는 대신 답사길에서의 느낌표들로 채울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도 감사했다.
▶ 글·사진_ 박샘별 사진_ 조성봉, 남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