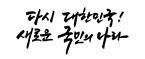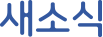- 제목
- 고된 훈련이 빚어낸 소리
- 작성일
- 2016-12-05
- 작성자
- 문화재청
- 조회수
- 3611
후천적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득음’
득음은 ‘소리를 얻는다’는 뜻이다. 판소리에서는 일상적인 목소리가 아닌 특별한 목소리, 즉 판소리에 가장 적합한 목소리를 얻어야 한다는 말이다. 소리꾼이 훈련하는 과정에서 온갖 고초를 겪는 것은 바로 득음 때문이다.
어째서 득음이 중요한가? 신재효가 제시한 명창의 구비 요건 네 가지 중 인물은 타고나는 것이어서 후천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판소리는 공연예술이기 때문에 소리꾼의 인물이 잘나면 시선을 끌기에 좋을 것이다. 그러나 판소리사에는 인물에 상관없이 명창이 된 사람이 많았다. 박기홍은 기형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근세의 명창 임방울은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었다.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설도 소리꾼이 전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다. 사설은 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소리꾼이 사설까지 창작할 능력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문장 나고, 명창 난다’는 말이 있는 모양이다.
마지막으로 너름새 또한 판소리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너름새를 하지 못했던 명창도 많이 있었다. 대체로 동편제 소리꾼들은 너름새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전남 보성 지방에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보성소리를 하는 소리꾼들도 마찬가지였다. 근세의 김소희 명창도 춤 동작을 벗어나는 너름새는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득음을 하지 못한 명창은 없다. 판소리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득음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달성이 가능한 영역이다. 그래서 판소리 창자에게는 득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으뜸으로 여기는 소리의 조건
판소리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는 일단은 목쉰소리이다. 그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대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판소리는 장시간 노래를 불러야만 하는 예술이다. 오랫동안 큰 소리로 노래하다 보면 목이 쉬기 마련이다. 이 상태로 계속해서 소리를 하면 목이 쉰 상태가 그대로 굳어버린다. 이렇게 고비를 넘기면 장시간 노래를 불러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는 없다. 그러므로 소리꾼들의 수련은 멀쩡한 성대를 영구적인 병적 상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계속 상처를 내서 흉터투성이로 만드 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판소리 창자들의 성대는 양쪽 성대가 똑같지 않아서 비대칭형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가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성대에 혹이 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상태에서 판소리 창자들은 소리를 한다. 그러면 거칠기는 해도 몇 시간씩 변화 없이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다.
목이 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판소리에서 가장 좋은 소리는 ‘곰삭은 소리’이다. ‘삭다’는 김치나 젓갈 따위의 음식물이 발효되어 맛이 든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소리가 삭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김치나 젓갈이 충분히 삭게 되면 자극적인 맛이 사라지고, 삭기 이전에는 없던 맛과 향기를 지니게 된다. 이처럼 소리를 수련한다는 것은 거친 목에 여러 가지 감정을 담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는 뜻이다. 거칠고 얕았던 소리가 부드럽고 깊은 맛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판소리의 맛과 향기를 대표하는 것은 ‘슬픔’이다. 슬픔이 배인 소리를 판소리에서는 ‘애원성’이라고 하며, 이를 곧 최상의 목소리라 평가한다. 일제 강점기에 많은 사랑을 받은 임방울의 <쑥대머리>는 바로 이 애원성의 극치를 보여준다. 하지만 슬픔이 지나치면 ‘노랑목’이라고 해서 좋지 않게 본다. 결국 판소리에서 얻고자 하는 소리는 거칠면서도 맑고, 한편으로는 슬픔이 깃든 그런 소리이다.
명창이 되기 위한 백일공부
득음을 위해 소리꾼이 택하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백일공부’이다. 백일공부란 판소리를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 좋은 목소리를 얻기 위해 혼자 깊은 산속이나 절에 들어가 100일을 기약하고 수련하는 것을 가리킨다. 100일을 채우기 위해 소리꾼들은 대체로 단오에 들어갔다가 추석에 나온다.
왜 하필 절이나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일상적인 일에서 벗어나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고 수련하는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 수련 과정에서 소리꾼의 목은 쉬었다가 풀리기를 반복한다. 나중에는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기도 하고, 온몸이 부어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때로는 목에서 피가 넘어오기도 한다. 옛날이야기처럼 피를 한 동이나 쏟지는 않지만, 성대가 부었다가 터지면 피가 날 수도 있다. 이렇듯 소리꾼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득음의 어려움은 명창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었다.
백일공부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 번으로 좋은 목소리를 얻을 수 있다면 명창이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소리를 하다가 목이 나빠졌을 때도 목을 회복하기 위해 백일공부를 하기도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잘못하면 아예 성대가 상해서 판소리를 부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목이 부러졌다’고 한다. 그러면 소리를 포기한 채 고수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 고수로 유명했던 김득수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반면 박봉술은 부러진 목으로 새로운 발성법을 연구해 명창이 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좋은 목소리만 얻었다고 해서 명창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소리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교도 자유자재로 구사해야 하고, 감정 표현도 풍부해야 한다. 너름새도 잘하면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완성한 상태, 그것이 넓은 의미의 득음이다.
글‧최동현(군산대 국문과 교수) 사진‧유네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