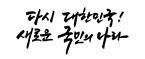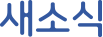- 제목
-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축, 짐대와 당간
- 작성일
- 2012-11-14
- 작성자
- 문화재청
- 조회수
- 4977

‘솟대’의 올바른 명칭 ‘짐대’
솟대라는 용어는 학자들의 책상에서만 쓰일 뿐, 민속 현장에서는 짐대, 진대, 돛대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립민속박물관이 1990년부터 1997년까지 8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현지 조사한 『OO지방 장승·솟대신앙』이라는 8권의 보고서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솟대는 1932년 손진태의 『소도고蘇塗考』에 처음 등장한다. 이 논문에서 손진태는 솔대·솟대는 소도의 음역으로 인식하고, 소도·솔대·솟대·소대를 동원어同源語로 해석하고 있다.
『삼국지』위지 동이전 한전의 소도 기록에 쓰인 ‘입대목현령고立大木縣鈴鼓’라는 구절을 바탕으로, 소도=솟대를 등식화시켜놓고 민속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를 외면한 채 마을에 세워진 신간神竿을 솟대라고 지칭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사료의 해석이 논리적이어야 한다. 오늘날 짐대는 긴 장대 꼭대기에 오리(또는 기러기)가 장식되어 있다.
이와 달리 마한의 소도는 방울과 북이 긴 장대에 걸려있는 형태이다. 방울과 북은 마한의 신기神器로서 이것이 오늘날 짐대의 오리로 바뀐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소도와 솟대의 관련성은 부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짐대가 왜, 어떻게 출현했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리가 필요하다.

짐대와 돛대는 당간에서 나오다
지금도 민속 현장에서 농민들은 짐대, 진대, 돛대, 오릿대, 오리짐대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민속 연구의 기본은 현장민속어를 그대로 쓰는 일이다. 진대는 ‘진압鎭壓하는 장대’를 말하고, 돛대는 배 모양의 ‘행주형지세行舟形地勢의 장대’를 일컫는다. 진압은 풍수지리 용어인 압승壓勝과 동의어다.
짐대를 세우는 목적은 땅의 사악한 기운과 재앙을 눌러서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있다. 이처럼 짐대는 지기地氣가 센 터를 눌러준다는 풍수비보의 상징물로서, 행주형지세에 세워지면 돛대가 된다. 행주형지세는 배의 형국을 말하는 것으로, 배가 돛대도 아니 달고 항진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헌에 따르면 행주형지세에 세워지는 돛대를 주장舟檣이라 하고 돛대의 재질은 쇠, 돌, 나무인데 쇠돛대는 철장鐵檣, 돌돛대는 석장石檣, 나무돛대는 목장木檣이라고 한다.
역사상 행주형지세에 세워진 돛대는 청주읍성의 용두사 터의 동장銅檣이다. 이 돛대는 오늘날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에 위치한 용두사지 철당간(국보 제41호)을 가리킨다. 기록에는 고려 광종 13년(962) 청주읍성 안 용두사龍頭寺에 세웠다고 한다. 용두사는 명처명산名處名山에 절을 세우면 국운國運을 돕는다는 도참설圖讖說과 불교신앙에 의해서 세운 풍수비보사찰이었으며, 동장은 풍수비보 기능의 쇠돛대鐵檣였다. 청주시민들은 철당간을 돛대라고 부르고, 읍성을 주성舟城이라고 부르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나주목 고적조에는 읍성 동문 밖에는 석장이 세워져 있고, 동문 안에는 목장이 세워져 있다고 하였다. 나주읍이 행주형지세였기에 주를 설치할 때에 석장과 목장을 세웠다는 내용이다. 나주시의 석당간은 사찰과 관계없이 읍성 안팎에 당간을 설치했음을 보여준다.
사찰의 당간은 신성한 곳의 경계점이며 불보살의 위신을 상징하는 번幡을 달아두는 장대이다. 그러나 모든 당간이 당번을 거는 깃대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담양읍의 석당간과 안성 칠장사와 공주 갑사의 철당간은 당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왜냐하면 풍수비보가 건립 목적이기 때문이다. 당간이 쇠와 돌로 만들어진 것은 압승의 의미가 있다.
땅의 나쁜 기운을 눌러서 압승하려면 무겁고 강한 철당간과 석당간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공주 갑사의 철당간은 입지의 원형성을 보여준다. 통일신라 말에 건립된 갑사의 철당간은 사찰 내 행주형지세에 세워져 있다. 신라 말에 사찰의 행주형지세에 세워지던 당간이 풍수비보사상이 성행하던 고려시대에는 사찰뿐만 아니라 행주형지세의 읍성으로 확산되었다.
사찰 당간이 읍치당간邑治幢竿으로 변모하면서 돛대라는 명칭으로 불리었고 진압하는 장대인 ‘진대’가 나오고 진대와 비슷한 ‘짐대’라는 소리음으로 정착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돛대에 오리를 앉히다
사찰과 읍성 안팎에 세워지던 짐대가 조선 후기에 마을로 내려온다. 그리고 형태에 변화가 생긴다. 행주형지세에 세워지던 하나의 돛대는 세 개의 짐대로 나누어진다. 돛대는 세 마리의 오리를 앉힐 목적으로 분화한다. 또 세 개의 오리짐대를 세우는 방식과 하나의 간주에 세 마리의 오리를 장식하는 방식까지 등장한다.
오리짐대의 출현은 숙종 15년(1689)에 세운 부안읍성 서문 안 돌짐대의 건립 명문으로 알 수 있다. 부안읍에는 남문 안 돌돛대와 남문 안, 동문 안, 서문 안 세 곳에 오리짐대가 세워져 있다. 세 마리의 오리는 동쪽, 남쪽, 서쪽에 위치한 만다라曼陀羅의 세계를 향하고 있다.
세 곳의 오리짐대는 세 마리의 나무오리를 날려 보내 떨어지는 곳에 사찰과 마을을 조성한다는 목부비공형木鳧飛空形 설화를 차용한 것이다. 목부木鳧는 나무오리란 뜻인데, 고승高僧들이 나뭇가지를 주워서 손으로 주물럭거려 오리를 만들어 날려 보내 내려앉는 세 곳에 사찰을 조성한다는 택지법擇地法에서 비롯하였다. 택지법은 어떠한 땅을 택지하여 만다라를 조성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불교적 술법이다. 오리가 떨어진 마을은 사찰(만다라)과 같은 성역화된 공간의 상징성이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짐대는 불교민속의 산물이다.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으로 불교가 민속화 하는 과정에서 당간의 간주竿柱와 택지법의 오리가 조합하면서 장대 끝에 오리 조각을 올려놓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형태인 오릿대, 오리짐대가 마을에 출현한 것이다. 행주형지세의 돛대에 오리를 앉혀 오리짐대로 변화하였고, 후대에 내려올수록 널리 확산되면서 세 마리에서 한 마리까지 앉히는 짐대문화로 정착하였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다
짐대가 땅의 사악한 기운을 눌러 평안을 추구하는 풍수비보 기능의 간주라면, 오리는 만다라와 같은 장엄한 불국정토세계가 마을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 땅에서 높이 솟아서 곧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오리짐대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며 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담고 서 있는 것이다.
한편, 오리짐대는 마을과 고을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상징물이기도 하다. 태평성대에는 굳이 오리짐대를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숙종 연간에는 소빙기(이상기후현상)를 겪으며 자연재해에 따른 흉년, 기근과 전염병이 만연하는 아비규환의 시기가 있었다. 굶주려 죽고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빈번하던 17세기 말 암울한 시점에서, 민심은 흉흉해지고 사회 불안이 극에 달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삶터를 지켜내려는 처절한 몸부림에서 오리짐대를 세운 것이다. 주민들은 삶터에 오리짐대를 세워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고 천상의 극락세계가 마을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극락조極樂鳥에 빌고 또 빌었던 것이다.
글·사진·송화섭 전주대학교 교수 사진·문화재청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