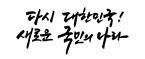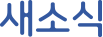- 제목
- 그 겨울 보원사지엔 무슨 일이 있었나? - 독자가 전하는 문화재 이야기
- 작성일
- 2007-02-20
- 작성자
- 문화재청
- 조회수
- 2561
그 겨울 보원사지엔 무슨 일이 있었나?지난해 겨울. 문화재 동호회 사람들과 충남 서산의 보원사지로 떠났다. 도착하니 새벽 4시 반. 어두운 보원사지의 복판으로 희미하게 당간지주가 보인다. 차문을 열고 나서자 칼같이 매서운 바람이 뺨을 때린다. 온통 눈밭이 신비롭기만 하다. 보름달이라도 휘영청 밝았으면 금상첨화일텐데…. 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른 새벽의 신선함, 청량감, 폐사지의 그 신비감이 너무도 좋다. 피부는 얼어버릴 것 같지만 마음이 훈훈하다.
아! 이 기분을 누가 알까.
언 개울을 건너 보원사지를 향한다. 생각보다 두텁게 눈이 쌓여 있다. 얼고 쌓이고, 얼고 쌓이고를 몇 번 반복한 듯하다. 제법 단단하다. 몇 해 전 겨울에 찾았을 땐 서리로 가득했었는데, 이젠 온통 눈밭이다. 어디가 수풀이고 어디가 도랑이었는지 알 수 없다.
저 멀리 서서히 동이 터 오고 있다. 동편 가야산 자락으로 옅은 핑크색의 여명이 솟아오고 있었지만, 날이 흐리다. 당간지주로부터 오층석탑으로 이르는 길. 개울은 두터운 얼음장과 눈에 파묻혀 와 보지 않은 사람은 이곳에 개울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일이다. 길은 어느 곳에 있는지, 방향을 짐작으로 맞춰 가며 오층석탑에 이른다. 부도비 앞 철 난간의 높이를 통해 대충 눈의 높이를 가늠해 본다. 아마도 50cm는 족히 되고도 남을 듯하다.
일행들은 오층석탑과 부도를 감상하고, 나는 주변 민가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물론 비료 포대를 구하기 위함이다. 새벽의 고요함을 깨고 개들이 짖기 시작했다.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주민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곳곳을 뒤지다가 문득, 부도비 옆의 집 하나가 생각났다. 전에 처사님 한 분이 살고 계셨던 곳인데, 지금은 폐가가 된 듯하다.
문짝과 창틀이 죄다 뜯겨져 있었다. “저 곳엔 분명, 내가 원하는 게 있을 거야.”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비료 포대는 아니지만 비슷한 알루미늄 방열제 두루마기를 발견했다. 바닥을 쓱쓱 문질러보니 제법 속도가 날듯하다. 의기양양. 두 조각의 두루마기를 잘라 먼지가 묻은 부분을 잘라내고, 일행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그때부터, 개들의 울음은 들리지 않았다. 보원사지 가야산 자락을 타고 낯선 비명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끼아아아악~~~악~악~악~악~악”
보원사지는 일순 아수라장이 되었다. 넓은 폐사지 곳곳에 어지러운 발자국들이 찍혔고, 부도비 앞의 언덕배기는 여지없이 알루미늄 방열제 두루마기에 의해 문질러지고 있었다. 때론 격렬하게, 때론 말도 안 되는 폼으로 일행들은 몸을 날렸다.
눈 쌓인 새벽 보원사지에서의 시간들….
고요한 적막을 깬 것이 못내 미안했지만 너무도 즐겁고 소중한 기억이었다. 앞으로 몇 년, 혹은 몇 십 년간, 그 곳에 그렇게 많은 눈이 쌓일는지도 모를 일이고, 또 그 곳을 몇 번 더 찾을 동안 같은 일행들과 함께 할지도 의문이지만 그래서 더욱 추억 속에 남을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여하튼 눈 덮인 유물들을 제대로 살펴 볼 기회가 없어 아쉬웠지만 ,겨울 폐사지의 또 다른 감동을 안고 서산 마애삼존불을 향해 자리를 옮겼다.
글ㆍ김민주(서울시 노원구)